프롤로그
개론┃음악에 대하여
1부┃음악의 일반적인 특성
a. 음악과 조형예술, 그리고 음악과 시
b. 음악에서의 내용
c. 음악의 효과
2부┃음악적 표현기법을 형성하는 특수한 요소들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
a. 박(拍), 박자, 리듬
b. 화음, 음들의어울림
c. 선율
3부┃음악의 표현수단과 음악이 표현하는 내용과의 관계
음악의 표현수단인 여러 영역들에 대한 개요
a. 보조음악(시를 동반한 음악)
b. 자립적 음악(기악음악)
c. 예술적인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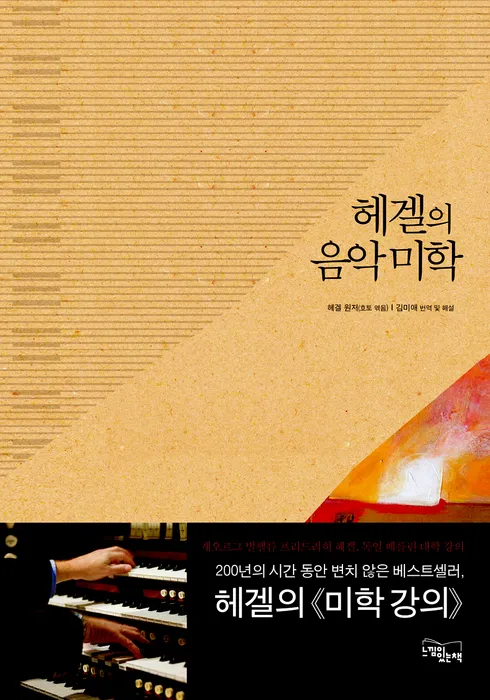
Rate
3.4
Average Rating
(15)
(15)
Comment
More
헤겔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자연과 인생의 이치를 통해서, 그리고 건축, 미술, 시 등 타 예술의 원리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공감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그의 음악 미학은 단순히 음악이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전반과 인간성까지 넘나든다. 그런 헤겔의 강의록에 음악가이자 음악 학자인 김미애 교수의 해설이 친절하고도 자세히 더해져 이 책에 담겼다.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뜻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어있는 참뜻을 끌어내어서 독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헤겔의 철학에 공감하고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억의 문 열어볼까요?
코고나다감독 판타지 감성 시네마
빅 볼드 뷰티풀 · AD
Rating Graph
Avg 3.4(15)0.5
4.5
5
기억의 문 열어볼까요?
코고나다감독 판타지 감성 시네마
빅 볼드 뷰티풀 · AD
Author/Translator
Comment
4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
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200년의 시간 동안 변치 않은 베스트셀러
헤겔의 《미학 강의》
독일의 관념론적 철학을 완성시킨 헤겔은 1820~1829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미학과 예술 철학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본서의 모체가 된 《미학 강의》는 1823년에서 1826년 사이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으로 이 시기는 헤겔의 철학적 깊이가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시기라고 평가되고 있다.
헤겔은 자신의 강의를 따로 책 형태로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이자 철학자인 호토(Gustav Heinrich Hotho, 1802~1873)가 헤겔의 강의를 들으며 받아 적었던 노트 및 그 당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의 노트를 참고하여 세 권으로 구성된 《미학 강의》를 1835, 1837, 1838년에 차례대로 편찬해 출간하였다. 《미학 강의》는 세상에 선보인 즉시부터 학계의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베스트셀러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재판되고 있다. 본서는 《미학 강의》 중 세 번째 권인 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발췌한 <음악(Die Musik)편>이다.
헤겔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자연과 인생의 이치를 통해서, 그리고 건축, 미술, 시 등 타 예술의 원리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공감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그의 음악 미학은 단순히 음악이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전반과 인간성까지 넘나든다.
그런 헤겔의 강의록에 음악가이자 음악 학자인 김미애 교수의 해설이 친절하고도 자세히 더해져 이 책에 담겼다.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뜻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어있는 참뜻을 끌어내어서 독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헤겔의 철학에 공감하고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계의 호평과 인정을 동시에 받은 위대한 고전
헤겔의 음악 미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첫째, 음악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과 음악이 발휘하는 효과에 대하여 파악한다. 음악을 재료·형식·정신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다른 예술들과 비교했을 때, 각 예술의 특징과 그 특징이 음악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다.
둘째, 음악 고유의 특성을 다룬다. 음과 리듬, 실제의 소리와 전달하는 면에서의 특이점을 살피는 것이다.
셋째, ‘음악이 표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느낌이나 상상, 그리고 관찰 등이 이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시(가사)를 동반하는 음악의 방향과, 또는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음악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런 커다란 줄기로 이어지는 헤겔의 음악 미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음악을 건축과 조각, 시 등과 비교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고 음악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예술 영역에 대해 다뤘다. 헤겔은 음악이 조형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세계라고 칭했고 시문학과의 유사성과 그 안에서 갈라지는 차이 또한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음악에서의 음들이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통한 표현이라 칭하며 그 근간을 이루는 속도, 박자, 리듬, 화성, 선율, 그리고 악기의 종류까지 아울러 다뤘다. 헤겔은 음악은 예술로 존재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말하며 그 특수한 규칙의 영역과, 영역을 넘나드는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논했다.
3부에서는 음악을 기술적으로 만드는 리듬이나 화성을 뛰어넘어 실제적인 표현을 다루는 선율과 가사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 예로 기악과 성악음악, 노랫말, 교회음악, 가곡, 극음악(오페라) 등이 다루어졌으며 예술적 연주의 두 가지 방향(악보에 충실한 것, 연주자의 재창조)도 함께 실었다.
본서 《헤겔의 음악 미학》의 특징은 원서의 번역에 충실한 것과 더불어 음악 전문가이자 교수인 김미애의 해설이 자세히 더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이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의 빈틈을 채우고 독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 형식은 원서의 틀을 해치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김미애 교수의 해설과 헤겔의 철학이 구분되어 알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헤겔의 음악 미학》은 음악을 예술 사조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도 음악 그 자체로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울로 음악을 비춰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즐거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음악을 하나의 악보나 기술이 아닌 통합적인 예술과 학문으로 다가서게 하는 올바른 통로로써의 역할을 해낸다. 또한 인간의 예술적 삶에 많은 지평을 열어준 음악을 다른 시선으로, 올바른 관점과 커다란 틀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창이 되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