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일회적이고 직선적인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복수적이고 끝없이 귀환하는 생명의 사건이다.”
죽음으로 생(生)을 사는 다인칭(多人稱) 몸의 목소리
‘혀 없는 모국어’ 사이에서 펼쳐지는 단 한 편의 시
세계인이 함께 읽는 이 시대 가장 뜨겁고 급진적인 언어, 김혜순
‘시하고’(I Do Poetry) ‘새하며’(I Do Bird) 시의 영토를 구축해온
김혜순 시학(詩學)의 정점, 죽음 3부작을 한 권으로 읽다
“나는 이 시들을 쓰며 매일 죽고 죽었다.
하지만 다시 하루하루 일어나게 만든 것도
이미지와 리듬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역설.
시는 죽음에의 선험적 기록이니 그러했으리라.
당신이 내일 내게 온다고 하면, 오늘 나는 죽음에서 일어나리.”
―「시인의 말」(『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2025)에서
2019년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 2022년 영국 왕립문학협회(RSL) 국제작가 선정,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상 수상, 2025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AAAS) 회원으로 선출. 모두 시인 김혜순이 ‘한국인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쓰고 걸어온 역사다.
지배적 언어에 맞서는 몸의 언어로 한국 현대시의 미학을 갱신하며, 그 이름이 하나의 ‘시학’이 된 ‘시인들의 시인’, 김혜순.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9년 이래 4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인은 늘 “제도화된 역사들과 가장 먼저 작별하는 시적 신체의 최전선”(이광호)에 서 있었다. 하여 김혜순의 시집은 단순히 한 시인의 저작을 넘어 각 시기 한국 현대시의 가장 첨예한 지점을 누구보다 앞서 이어낸 별자리, 시적 실험의 아카이브와 같다. 김혜순에게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뜨고 지면서 커지고 줄어드는 달처럼 죽고 사는 사진의 정체성을” 보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여성의 몸은 무한대의 프랙털 도형”이라 했던 시인은 자신의 시가 “프랙털 도형처럼 세상 속에 몸담고 세상을 읽는 방법을 가지길 바란다”(『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렇게 여성의 존재 방식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않으며, 시 속에서 전개되는 시간과 에너지, 긴장과 현기증 자체인 리듬, 그 리듬 안에 시의 미학과 윤리학을 작동시키는 방법론으로 독보적인 시적 성취를 이루어왔다. 또한 ‘여성이 몸에 실재하는 감정과 정체성에 충실하면서, 다정함과 격분이 공존하는 목소리로 악몽과 어둠을 관통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적 황홀’(스웨덴 시카다상 선정의 말)을 열어젖히며 굵고 또렷한 국제적 존재감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죽음으로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연대와 죽음에의 선험적 직관 사이를 오가며 생체험을 넘어선 미학적 시론을 구축해왔다. 사회적 참상, 전쟁의 트라우마 같은 집단적 슬픔과 개인의 죽음, 그 둘 사이의 연관을 구조적으로 직조해낸 ‘죽음 3부작’을 통해 여지껏 누구도 디디지 못한 언어의 신개지(新開地), 시의 영토를 오늘도 넓혀가고 있다. 시인의 연보가 말해주듯, 1979년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김혜순의 시의 시작(始作)은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경이로울 뿐이다.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문학과지성사, 2025)는 바로 이 죽음 3부작, 『죽음의 자서전』(2016), 『날개 환상통』(2019),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2022)를 한 권으로 묶은 시집이다. 올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선공개되어 독자들은 물론 해외 출판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책에는 죽음 3부작 시집들 시 전편을 비롯해, 미발표 산문 「죽음의 엄마」와 2022년 4월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 소개되어 화제를 모은 시 「고잉 고잉 곤(Going Going Gone)」(『날개 환상통』 수록)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총 5개 언어로 번역해 함께 실었다.
세 권 시집을 한 권으로 묶다 보니 전체 600쪽을 훌쩍 넘겼다. 시행이 길다 싶으면 위트 넘치는 시어와 시인 특유의 리듬이 갈마들고, 구술과 구송을 오가는 듯한 함축적인 시 또한 편편이라 바라건대 시마다 독자가 누리는 ‘펼친 면의 시간’이 충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철제본을, 그리고 합본 형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책등을 비운 노출 제본 형식을 택했다. “부모들은 저의 과거였다가 죽어서 저의 미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일상과 애도의 시퀀스가 반복되는 “죽음은 복수적이고 끝없이 귀환하는 생명의 사건”이라 명명한 시인의 말에 착안하여, 표지는 강렬한 핏빛 붉은 색지를, 내지는 각 권마다 흰 종이에 검은 먹 글자로 새기는 애도의 시와 다시 태우고 난 그을음 가득한 잿빛 종이를 한 장 한 장 엮는 마음으로 본문 용지를 달리했다. 앞표지에는 제의적 의미를 띠는 현대 미술가 ‘이피’의 드로잉을 먹 박인쇄로, 뒤표지에는 책의 제목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를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5개 언어로 옮겨 나란히 앉혔다.
표지와 본문에 드로잉 6점으로 함께한 현대 미술가 ‘이피’는 강화플라스틱부터 불화의 금분까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회화, 조각, 설치 작업을 병행하며, 여성의 몸에 기생하는 수많은 몸들(멸종한 몸, 미래의 몸, 감각으로 형상화된 타자의 몸)을 위한 제단을 구축해왔다. 2025년 한국인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재단(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s)이 제정한 도로시아 태닝상(Dorothea Tanning Award)을 수상했다.
“시인은 죽어가는 모든 존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는 건 요리와도 같지요. 요리가 저의 바깥에 있는 생물을 죽여서 조리하는 것이듯, 시도 살아 있는 것을 가져다 언어의 세계로 투척하는 것입니다. [……] 죽음은 개별적이고 각자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수동적 죽음을 반복하면서 죽임에 저항하는 존재인 시인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죽여 여럿, 즉 복수가 된 존재의 글쓰기이기에 ‘나’를 벗어나 타자와 소외된 존재와도 소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을 실천해나가는 것이 시의 정치학일 테지요.”
―김혜순(2024 광주 비엔날레 독일관 김혜순 ×박술 대담에서)
“딸이 자신의 엄마의 죽음을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아니’인가. 엄마의 삶이 삶이 아니고, 엄마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고, 딸이 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엄마의 삶에서 삶이 아니었던 것, 죽음을 끌어내고, 엄마의 죽음에서 죽음이 아니었던 것, 삶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제 엄마는 죽어버려서, 내 안의 엄마의 삶과 죽음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엄마의 삶과 죽음은 얼룩처럼 서로 스며들어 번져버렸다. 그리하여 엄마는 이제 삶 이전과 이후, 죽음 이전과 이후에 두루 편재해서 시를 쓰는 여자(딸)의 딸이 되어버리고 하고, 엄마의 엄마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시 쓰는 여자 자신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
여자는 태어나면서 이미 벌써 죽음에 들려(possessed) 있다. 마치 시인의 운명처럼. 죽음이 선험적이다. 삶과 죽음을 풀어나가는 나의 시적 전략이 있다면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이와 같은 시선이다. [……]
딸과 함께 엉긴 삶, 딸과 함께 번진 삶, 딸과 함께 편재한 삶, 그리하여 엄마는 사막처럼 부재하나 존재하게 되었다. 모래처럼 삶/죽음의 ‘/’에 처한 존재들처럼. 두 입술이 겹쳐지게 되었다. 엄마는 엄마가 ‘아니’게 되었다. 죽음이 ‘아니’게 되었다.”
―산문 「죽음의 엄마」에서
죽음 3부작 제1권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죽음의 자서전(Autobiography of Death)』(2016)이다. 2015년, 김혜순 시인은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몸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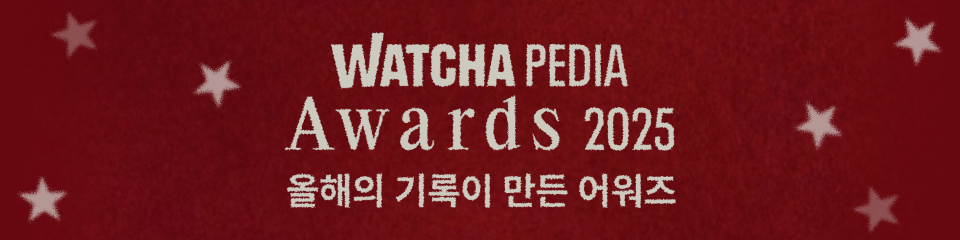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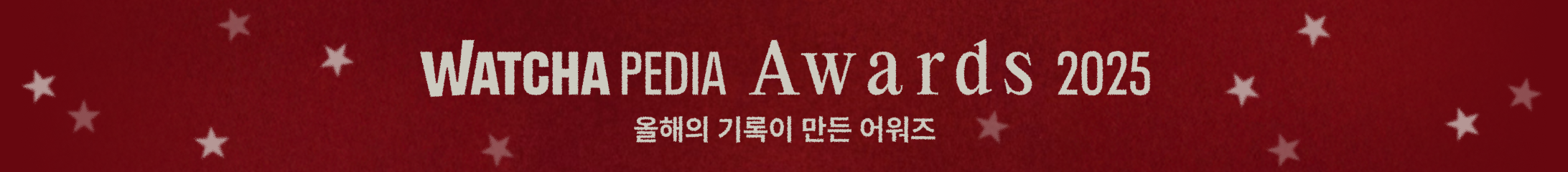


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