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디의 섬광 Bolts of Melody
나 계속 노래할래! 13 / 시인은 이랬어 15 / 그림 나라면 그리지 않을 듯 17 / 그들은 나를 산문 속에 가두었지 21 / 내게서 나를 추방하는 23 / 시인들은 그저 램프를 밝힐 뿐 25 / 군함 없어도 책 한 권이면 돼 27
어떤 비스듬 빛 하나 A Certain Slant of Light
성공의 달콤함을 가장 잘 헤아리는 건 31 / 위에 계신 아빠! 33 / 어떤 비스듬 빛 하나 들어오는 35
나는 고통의 모습이 좋아요 37 / 영혼은 직접 선택해서 사귀지 39 / 내 머릿속에서 장례식이구나 생각했지 41 / 더 고독할지 몰라? 43
바람의 술꾼 Inebriate of Air
나는 전혀 숙성 안 한 술맛을 알아 47 / 난 아무도 아냐! 넌 누구니? 49 / 그녀는 오색 빗자루로 청소하다 51 / 다친 사슴이 가장 높이 도약한단다 53 / 생각은 아주 엷은 막 밑에서 55 / 내가 죽음을 위해 멈출 수 없어 57 / 나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으나 드문 일 61
장전된 총 A Loaded Gun
내 평생 세워둔 장전된 총이었는데 65 /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 69 / 나는 딱 두 번 잃어버렸어요 71 / 토끼방울꽃이 자기 거들을 풀어 73 / 밤은 사납고 거칠어! 75 / 그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일어났다 77 / 출판은 경매예요 79
풀밭 속 가느다란 녀석 A Narrow Fellow in the Grass
새 한 마리가 산책길에 내려왔는데 83 / 가느다란 녀석이 풀밭 속을 85 / 내가 일찍 출발했거든 나의 강아지도 함께 갔어 89 / 노란 길 따라 그 눈이 93 / 친절한 눈으로 제때 뒤돌아보면 95 / 나 죽을 때 파리 한 마리 붕붕대는 소리 들렸는데 97
가능 속에 살아 Dwell in Possibility
나는 가능 속에 살아요 101 / 진실을 모두 말해 하지만 삐딱하게 말해 103 / 두뇌는 하늘보다 넓지 105 / 나는 광야를 본 적 없어요 107 / 내가 예측건대 모두 헤아려보니 109 / 대평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클로버 하나 벌 한 마리 111
“희망”이란 깃털 달린 놈 “Hope” the Thing with Feathers
많이 미치면 굉장한 신의 감각이 생겨 115 / 말 한마디가 있어 117 / “희망”이란 놈은 깃털이 있어 11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에밀리 디킨슨 · Poem
16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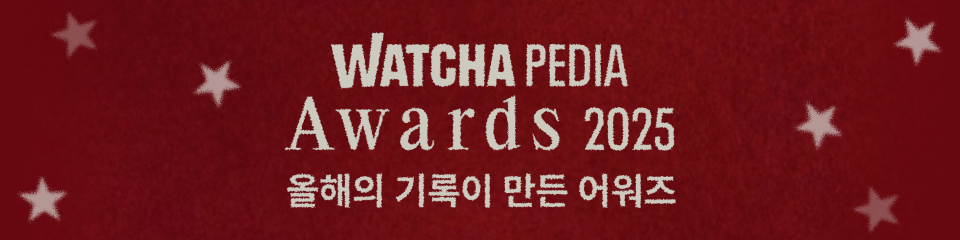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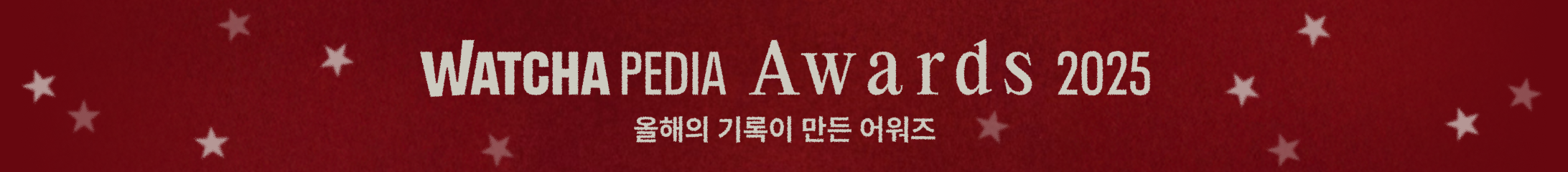
파시클 출판사의 첫 에밀리 디킨슨 시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새로운 표지와 구성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개정판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은 초판에 수록된 시들을 필사본에 맞춰 시 형식을 다시 정리하여 옮겼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들 가운데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인 시들을 번역자 박혜란이 고르고 모았다. 시인의 평생을 함께한 주제였던 시학, 여성적 자아, 고독과 고립, 자연, 삶과 죽음, 등을 다룬 56편의 ‘제목 없는’ 시들을 8장으로 묶어 시집에 담았다.
《데일 카네기 NEW 인간관계론》 정식 출간
시대를 초월한 원칙, 시대를 반영한 해설
한빛비즈 · AD
《데일 카네기 NEW 인간관계론》 정식 출간
시대를 초월한 원칙, 시대를 반영한 해설
한빛비즈 · AD
Where to buy
본 정보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Author/Translator
Comment
6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내가 읽은 책 한 권으로 인해 온몸이 오싹해졌는데 그런 나를 어떤 불로도 따뜻이 못한다면,
그게 시예요. 마치 정수리부터 한 꺼풀 벗기듯 몸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시예요.
오직 이런 식으로만 나는 시를 알아요. 다른 방법 있나요?
_에밀리 디킨슨, 토마스 웬트워스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100여 년 전 페미니스트 뮤즈로부터 당신에게
미국 여성 시인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시선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출간되었다.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총 56편의 ‘제목 없는’ 시들을 담고 있다. 시인이 생전에 손제본 형태로 직접 만들곤 했던 시집을 일컫는 이름인 ‘파시클’, 이 책을 낸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에밀리 디킨슨은 현재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미국 시인 가운데 한 명이자, 후배 시인과 비평가는 물론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페미니스트 뮤즈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디킨슨의 시가 처음부터 전 세계 독자들이 애송하는 시였던 것은 아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고 조용한 도시 애머스트에서 태어나, 188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무려 1,800여 편의 시를 썼지만 생전에 발표했던 시는 지역 신문에 실린 7편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디킨슨이 자신의 시를 대중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디킨슨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편지 형태로 시를 보내곤 했다. 그리고 40여 편씩 시를 묶어 직접 필사하고 편집하여 ‘파시클’이라는 시집을 만들어두었다. 그 파시클 44권이 시인이 죽은 후 발견되었고, 4년이 지나 첫 시선집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선집이 출간되어 세상에 전해졌다.
“출판은 경매예요”
이렇듯 에밀리 디킨슨이 생전에 시를 집필하고 세상으로 내보낸 특유의 방식, 그리고 작은 도시 안에서만 살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았고 공적 저술이나 사회·정치 참여 활동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우리는 그녀를 ‘여성주의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정의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시인의 시들에서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리하게 읽어내는 재미를 놓치지 말자는 말이다. 시인이 시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면, 이때 여성의 목소리란 대체 무엇인지, 또한 여성의 삶 속에서, 동시에 그 삶의 울타리를 훌쩍 벗어나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 닿는지, 이 책의 시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영문학 박사인 편역자 박혜란은 에밀리 디킨슨이 1,800여 편의 시에서 “기존 문학 전통과 관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창적 표현을 실험”했으며, “주변의 일상과 자연 속에서, 혹은 독서를 통해 발견하고 사유했던 여러 주제들, 예를 들면 사랑, 죽음, 상실, 영원함, 아름다움 그리고 글쓰기와 읽기의 즐거움을 노래”했다고 설명한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보편적인 주제를 노래할 때에도 “당시 청교도의 엄숙함이나 가부장적 질서, 물질주의 생활양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과 형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지적대로 에밀리 디킨슨의 시들은 아무리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읽기에 무겁지만은 않다. 점잔을 떨거나 자기 불만을 헛기침으로 에둘러 전달한다거나 정색하고 일침을 놓는 것은 전혀 디킨슨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장난꾸러기 요정 또는 세상사에 통달한 여신이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쏟아내는 느낌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엄숙함, 가부장 질서, 물질주의의 허를 찌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출판은— 경매예요 / 인간의 정신을 사고팔지요— / 가난으로— 그런 추잡한 일을 / 정당화하겠죠
(「출판은— 경매예요」 부분)
그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일어났다— 평생 / 갖고 놀던 놀잇감들을 팽개치고 / 명예로운 일을 맡으려고 / 여자라는, 아내라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일어났다— 평생」 부분)
나 죽을 때— 파리 한 마리 붕붕대는 소리 들렸는데— / 방 안은 고요 / 몰아치는 폭풍 사이— / 공중의 고요 같았다— // (중략) // 나는 내 유품을 유언하고— 서명을 마쳤다 / 나의 어떤 부분을 / 지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 거기 끼어든 파리 한 마리— // (후략)
(「나 죽을 때— 파리 한 마리 붕붕대는 소리 들렸는데—」 부분)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수많은 ‘나’들의 향연
역자는 에밀리 디킨슨 시의 서술상 전반적인 특징 중 하나로 ‘1인칭 화자’를 꼽는다. 바로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직접 토로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의 ‘서정시’로 국한하기는 어렵다. 디킨슨의 시에서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디로든 옮겨가며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지 옛날 소도시에서 별다른 바깥 활동 없이 평생을 살았던 어떤 여자의 목소리라고 전제한 채 읽어나가다가는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시에서는 별안간 ‘총’이 화자로 등장한다.
내 평생 세워둔— 장전된 총이었는데— /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느 날 / 주인이 지나다— 알아보고는— / 날 챙겨 나갔다— // (중략) // 그리고 밤이면— 근사했던 우리의 하루를 마치고— / 나는 나의 주인의 머리를 경호한다— / 함께하기에는 오리 솜털 / 푹신한 베개보다— 그게 더 낫다— // (중략) // 비록 그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더라도 / 그가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나보다— / 나는 죽일 힘만 있고— / 죽을 힘은— 없으니까—
(「내 평생 세워둔 — 장전된 총이었는데 —」 부분)
이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는(독자 자신이 먼지 쌓여 있다가 드디어 쓰이게 된 ‘총’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에 대해 역자는 “파괴의 힘을 지녔지만 주인/주체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상상력일 수도 있고, 힘과 능력은 있으나 자유 없이 복종하며 주인을 지키는 존재인 노예의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해설한다.
이 시 외에도 디킨슨이 일종의 ‘빙의’를 통해 재현하는 ‘나’는 주로 ‘대상’으로 인식되던 어떤 존재인 경우가 잦다. 소녀 때 어른들에 의해 옷장 안에 갇혔듯이, 이제 산문 속에 갇힌 자((「그들은 나를 산문 속에 가두었지」), 다들 ‘진리’를 위해 죽을 때 드물게도 ‘아름다움’을 위해 죽은 자(「나 아름다움을 위해 죽었으나 — 드문 일」),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자[nobody](「난 아무도 아냐! 넌 누구니?」) 등이 “자신을 주어로 말할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폭발력과 수동성의 역설을 말하는 언어의 힘”에 주목해 읽는다면 한층 긴장감 넘치는 읽기가 될 것이다.
‘파시클’의 첫 책, 디킨슨의 ‘파시클’
파시클 출판사에서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계속 번역하여 소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에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 7편과 그 시들에 대한 신혜원 작가의 그림을 엮은 ‘그림 시집’ 4권을 스페셜 에디션으로 먼저 펴낸 바 있다. 파시클의 첫 책이 디킨슨이 생전에 자기 시를 세상과 나누던 고유의 방식을 따른 ‘파시클’ 시집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이 출판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독자에게 책을 전하고 나눌지에 대한 포부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 첫 출발인 이 시집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실린 시들은 주로 역자가 특히 좋아하는 시들이라고 한다. “에밀리 디킨슨을 읽는 즐거움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시들을 고르고 옮겼다.
사실 디킨슨의 시에는 전부 제목이 없으며, 그만큼 독자가 읽고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읽힐 수 있다. 시집은 그 점을 충분히 존중하고자 원문의 맛을 살리고 원문(영어)도 번역문 바로 옆쪽에 함께 싣는 배려를 했다. 그러면서도 ‘옛날 시’라는



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