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울의 내가
현호정 · Novel
26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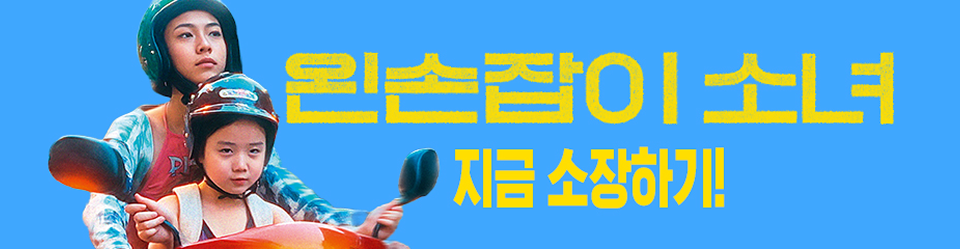

2021년 『단명소녀 투쟁기』로 “나는 나의 죽음을 죽일 수 있다”는 필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언으로 등장한 현호정 작가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자들과 평단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선보이고 있다. 2023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연필 샌드위치」를 포함해 4년 동안 발표한 단편 가운데 여덟 편을 추려 이번 소설집으로 엮었다. 소설집 안에서 단편들은 각각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단편의 첫 문장을 꼭 움켜쥐는 식으로 다정히 연결되어, 하나의 물줄기로 흐른다. 작가가 만들어낸 그 사랑의 물줄기는 책이라는 물관을 지나 독자에게 다양한 소리로 가닿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작년 5월 연극으로 올린 「한 방울의 내가」 희곡을 실어, 독자들에게 원작과 희곡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지면을 마련했다. 현호정이 아니면 결코 탄생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한 방울의 마음속’에 가득 찬 ‘한 방울의 그리움과 몸짓 그리고 시선’을 벅찬 마음으로 독자에게 전한다. 너와 개체로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세상 전체로 흩어뜨려 너에게 가닿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있다. (…) 그 고통의 크기야말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의 크기다. _「기생奇生의 사랑-현호정론」, 강지희(문학평론가)
왼손으로 쓴 삶, 용기를 묻다
흔들리는 카메라가 선명하게 붙잡은 삶
왓챠 개별 구매
왼손으로 쓴 삶, 용기를 묻다
흔들리는 카메라가 선명하게 붙잡은 삶
왓챠 개별 구매
Where to buy
본 정보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Author/Translator
Comment
4Table of Contents
라즈베리 부루
Raspberry BorO
돔발의 매듭
Dombal’s oooooooooooooooooooOO
~~물결치는~몸~떠다니는~혼~~
~~Oo~~
연필 샌드위치
o=O Sandwich
한 방울의 내가
As Ȯ of you
청룡이 나르샤
drag On blues
옥구슬 민나
Minnah O lord
작가의 말
모래 위의 H
H on the O
부록
희곡 ‘한 방울의 내가’
Description
“어쩌면 가장 좋은 눈물은 가장 작은 눈물일지도.”
현호정을 투과해 탄생한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곳,
한없이 작아졌다 무한히 확장되는 물질의 경계,
그곳에 모이는 터질 듯한 사랑이라는 마음들
『한 방울의 내가』 속 단편들은 저마다 몇 가지의 키워드를 나누어 쥐고 있다. 단편들은 손에 쥔 키워드를 마치 빈자리를 찾아 전철을 한 량 한 량 지나는 승객의 시선에 포착되는 누군가의 일어날 채비처럼 슬쩍 내비쳐, 독자에게 자신이 다른 단편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린다. 그들의 손에는 (생존을 위한) 식이, (다른 순환을 지니는) 잉태, (무효화되는) 시간성 들이 들려 있다.
생존을 위한 식이
먼저 소설집을 여는 「라즈베리 부루」는 핏물을 요구하는 식물 ‘부루’와 빌라 계단 아래 숨어 사는 ‘나’의 이야기다. ‘나’는 부루에게 생리대로 우린 물을 주고, 부루는 내게 건물 바깥으로 나갈 마음을 먹게 해준다. 둘이 정한 무언가를 주고받는 원칙은 “한 번에 많이 먹지는 못하니까, 조금씩 매일”이다. 둘은 각자의 생존에 필요한 식이를 서로에게 공급하고, 나아가 부루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돌본다.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밤이면 가장 넓은 잎사귀들 사이에 넣어 품어주었다. 늘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빨리 자라고 싶었지. 부루가 말했다. 엄마 같다. 내가 말했다.” 그 형태는 꼭 새로운 모습의 잉태 같다.
식이의 흐름은 「연필 샌드위치」에서도 발견된다. 꿈에서 연필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라는 명령을 받은 ‘나’는 먹기 싫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먹어야지만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느끼며 잘근잘근 나뭇조각을 씹는다. 그 맛은 내게 누룽지라는 익숙한 맛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수함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먹은 캔에 든 ‘구수한 맛’의 유동식과 거식 증상으로 나날이 축소되던 엄마가 그나마 마시던 누룽지 끓인 물로 이어진다. 당시 ‘나’는 엄마와 내가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여겨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고, 엄마도 할머니를 돌보면서부터 열심히 밥을 먹었다. 서로에게 식이를 전달하려는 행위 속에서 세 여자의 입은 어느 순간 탯줄로써 기능한다. 「~~물결치는~몸~떠다니는~혼~~」의 자연재해가 닥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 역시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이다. 생존을 위한 식이는 이렇듯 소설 전반을 엮는 끈으로 존재한다.
다른 순환을 지니는 잉태
“생식기가 하나의 자상”이 된 듯 피를 흘리는 여자아이를 식물이 품는 잉태의 모습은 「~~물결치는~몸~떠다니는~혼~~」에서 더 극대화된다. 세상이 바다에 잠긴 날, “어른들이 죽이지 않는 한은 잘 죽지 않는 아이들”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자라났다.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인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몸에 또 다른 신체를 매달고 태어났다. 그때까지 인간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흰 물질을 먹으며 생존했고, 그게 세상이 “바다에 잠긴 그날 죽은 이들의 몸이 분해된 유기물 뭉치”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다.
기생 쌍둥이로 태어난 세대들은 심장을 가진 자생체와 신체기관으로써 존재하는 기생체로 구성되어 그들끼리 생존하는 방식을 만들어나가지만,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결말에 맞닥뜨린다. 자생체의 장기를 나눠 쓰며 남는 에너지를 성장에만 쓰는 기생체는 어느새 자생체의 크기를 압도하고, 더 커진 기생체의 흡수력에 자생체는 나날이 기능을 잃어갈 뿐이다. 이 비대칭의 공존은 결국 자생체의 축소와 함몰을 일으키고, 그것은 곧 기생체 자신의 죽음이 된다. 이때 소설은 기생체를 매단 자생체들의 대화로 질문을 던진다. “아름다운 것과 살아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난 구분 못 해.” “난 안 해.” “그럼 최종적으로는 출산도 해야 할까?” “어떻게 낳지?” “낳은 뒤에는?”
일반적인 잉태와 출산의 과정에 큰 질문을 던진 이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기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이 흐름은 다시 「옥구슬 민나」로 연결된다. “민나는 민나의 어머니보다 먼저 태어났다. 민나의 어머니는 민나의 암소가 낳았고 그 암소가 태어날 때 민나가 도왔다”로 시작하는 소설에서 민나는 신이다. 민나를 만난 동물들은 궁금했던 것을 묻는다. 밀알만 한 강아지는 “여기서 작아지는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날갯짓하면 그대로 소멸할 거예요. 겁이 나서 아무 데로도 날아갈 수 없어요.” 하고, 용은 다시 도롱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앙앙 울고, 새는 자기 슬픔의 근원에 대해 묻는다.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신, 민나는 실존에 대한 질문들에 “세상 모든 입자이자 단 하나의 입자로서 텅 빈 우주를 가득 채”우며 증식함과 동시에 소멸되어 그곳에 존재함을 알린다.
세상을 바라보는 현호정만의 시선
물방울에 고이는 전생과 전철이 인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향한 포기 없는 간절한 손짓의 시각화
이 소설집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하기 위해 소멸되고, 소멸되기 위해 존재하는 아이러니. 어떤 존재를 사랑할수록 주변을 해쳐 스스로를 더 작게 분열시키다 결국 기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없음으로 만드는 시도. 그 시도에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 결별을 내포한 이 하나됨의 사랑 이야기는 「한 방울의 내가」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주 우는 자의” 눈물로 태어나 매끄러운 탄생을 가졌던 ‘한 방울의 나’는 작은 물방울로서의 삶보다 메이의 눈물로서의 삶을 지양한다. 누군가의 눈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큰 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작은 물의 순리와 충돌한다. “왜 나에게 합쳐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는 거야?” “기억을 잃는 게 싫어서 그래요. 저에게는 이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한 방울의 커져버린 그리움은 결국 자신을 “세계의 절반 이상”인 바다로 만들고, ‘나’의 그리움 역시 더 이상 “한 방울의 마음”이 아니게 된다. 메이에게 다가가려는 바다의 몸짓은 지나는 곳들을 폐허로 만들고, 결국 ‘나’에게 남은 결말은 하나. 한없이 가벼운 수증기가 되는 것이다. 수증기의 형태는 앞서 민나가 그랬듯 “세상 모든 입자이자 단 하나의 입자로서 텅 빈 우주를 가득 채”우며, 메이의 눈동자 속으로 다시 하강한다. 이야기는 ‘나’가 메이의 눈동자를 끌어안으며 탄생만큼이나 매끄러운 합일, 소멸로써 끝이 난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한 방울의 나’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효화되는 시간성
물방울일 때 만났던 아기 오리 비비와 ‘나’는 기원의 일부를 같이하는 존재다. 비비의 어미가 비비 이전에 낳은 알 속에서 ‘나’는 흰자로 존재했고, 그 알을 깨뜨려 먹은 어미가 다시 낳은 알이 바로 비비인 것이다. “잊지 않아도 잊히는 기억이 있다.” 비비 어미의 말을 떠올린 ‘나’가 말한다. “이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 잊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기억이 있다는 뜻이야.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 전생처럼 끊어내고 지나가야 할 과거가 있다는 뜻이야.” 한 물방울에 고인 생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를, 나와 관계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그 시선은 전철의 시점으로 인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와도 같은 소설 「청룡이 나르샤」로도 이어진다.
“당신에게 가려구요......”로 시작하는 「청룡이 나르샤」에는 자신 안에 타고 내리는 인간을 보며 전철이 품은 마음들이 담겨 있다. “당신 하나에 퍼부어지는 제 사랑이 박애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가볍고 무한합니다.” 정해진 선로만을 도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전철은 그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끝없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시도를 한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철제에 갇힌 혼, 인간을 향한 포기 없는 간절한 손짓,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전해 받을 수밖에 없는 물성을 전한다. 있지만 없는 것, 없지만 있는 것을 기어코 시각화하여 우리



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