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근처 / 찌랍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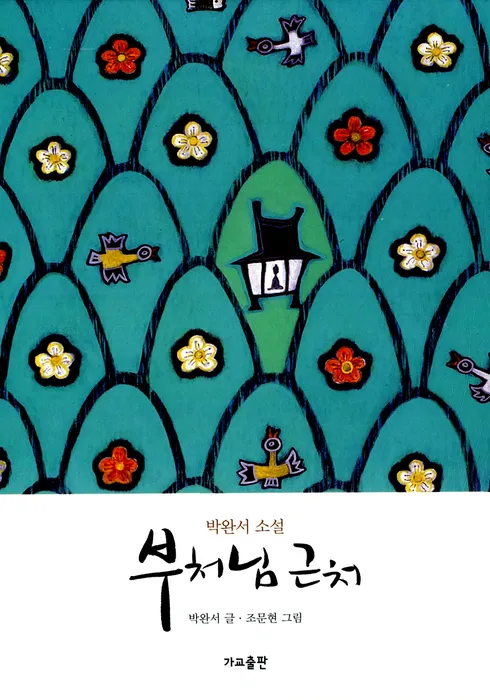
Rate
4.0
Average Rating
(18)
(18)
Comment
More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초기작품. 1973년 「현대문학」에 처음 발표된 이 작품은 6.25 동란 중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남자 가족을 잃은 모녀의 이야기이다. 박완서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담긴 자전적 소설로 박완서 자신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다. 옛 여인의 지혜로운 처세를 통해 잘못된 인습을 풍자하는 짧은 이야기 '찌랍디다'도 함께 엮었다.
Rating Graph
Avg 4.0(18)0.5
4
5
Author/Translator
Comment
2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
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40년 만에 만나는 故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조문현 화백의 그림과 만나 깊은 울림을 주는 책
박완서 서거 1주기를 추모하며 박완서 문학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초기작품 『부처님 근처』가 출간되었다. 1973년 《현대문학》에 처음 발표된 이 작품은 6·25 동란 중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남자 가족”을 잃은 모녀의 이야기이다. 박완서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담긴 자전적 소설로 박완서 자신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조문현 화백의 그윽한 그림이 마치 인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하다. 옛 여인의 지혜로운 처세를 통해 잘못된 인습을 풍자하는 짧은 이야기 「찌랍디다」도 함께 엮었다.
“6·25가 없었다면 내가 소설을 썼을까…”
박완서 문학의 뿌리인 비극적인 가족사가 담긴 초기 작품
1970년 마흔 살에 등단해 2011년 작고할 때까지 ‘영원한 현역’ 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박완서. 15년 넘게 평범한 주부로 살던 박완서를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6·25 때 겪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글로 토해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스무 살의 박완서는 6·25 때 숙부와 오빠를 잃는 과정에서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좌익과 우익이 서로 반동을 색출하며 총구를 겨누던 그 시기에 맞은 오빠의 비극적인 죽음은 박완서의 인생을 지배했다. 좌익에 가담했다가 전향했다는 이유로 양 진영에서 반동,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했던 박완서 오빠. 그는 1·4후퇴 때 사고로 총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 몇 달 뒤에 죽음을 맞는다. 모두 피난을 떠나던 1·4후퇴 때 부상당한 오빠 때문에 텅 빈 서울에 남아야 했던 박완서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경험한다. 그때 박완서를 견디게 한 것은 “언젠가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야기로 만들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완서는 작가가 된 후 데뷔작인 「나목」(1970)에서부터 「목마른 계절」(1971),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1972), 「카메라와 워커」(1975) , 「엄마의 말뚝 2」(198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등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6·25 체험이 녹아 있는 자전적인 소설을 써왔다. “토악질하듯이 괴롭게 몸부림을 치며” 그때의 기억을 소설로 쏟아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길 쏟아놓길 단념 못 하고 있다.” -본문에서
『부처님 근처』도 같은 맥락의 자전적 소설로 박완서의 고통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일인칭을 즐겨 썼던 건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독자도 절실하게 느끼게 하겠다는 욕망”이었을 거라는 박완서의 말처럼 이 작품도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을 목격하는 ‘나’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독자에게 그 악몽 같은 체험이 그대로 전해진다.
“죽음을 삼킨 여인들, 삶을 토해내다”
살아남은 자의, 삶을 향한 고통스러운 몸부림
좌익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나’의 오빠는 ‘동무’로부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총살을 당한다. 그러나 모녀는 빨갱이 가족으로서 이목이 두려워 “믿을 만한 인부를 사 쉬쉬 감쪽같이 뒤처리를 했다.”
“마치 새끼를 낳고는 탯덩이를 집어삼키고 구정물까지 싹싹 핥아먹는 짐승처럼 앙큼하고 태연하게 한 죽음을 꼴깍 삼킨 것이었다.” -본문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좌익에 가담하게 된 아버지는 세상이 바뀐 뒤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돌아온다. 그러고는 1·14 후퇴 후의 텅 빈 서울에서 숨을 거둔다.
‘나’와 어머니는 빨갱이로 매 맞아 죽은 아버지의 죽음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해 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녀는 앙큼하게도 두 죽음을, 두 무서운 사상(死傷)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꼴깍 삼켜버렸던 것이다.” -본문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삼켜버린’ 모녀는 그때의 공포와 죄책감, 억울함, 분노가 뒤죽박죽되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린다.
“내가 삼킨 죽음은 여전히 내 내부의 한가운데 가로걸려 체증처럼, 신경통처럼 내 일상을 훼방 놓았다. 나는 여전히 사는 게 재미없고 시시하고 따분하고 이가 들끓는 누더기처럼 지긋지긋해 벗어던질 수 있는 거라면 벗어던져 흠뻑 방망이질을 해주고 싶었다.”
-본문에서
망령에 갇힌 ‘나’는 “온갖 사는 즐거움, 세상 아름다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 당한 채 살아간다. 삼킨 죽음을 토해내고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나’는 상주가 곡을 하듯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오빠의 이야기를 꺼낸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답답함을 느낀 ‘나’는 그때의 일을 소설로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책으로 나온 자신의 소설을 읽고 ‘소설적인 진실’이 결여된 것을 느낀다.
“이런 나의 실패는 나의 능력부족의 탓도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과 내가 사는 시대의 비위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죽음이 내가 작품화할 수 있을 만큼, 즉 여유 있게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로 물러나주지 않고 너무 나에게 바싹 다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본문에서
가슴속에 맺힌 아버지와 오빠의 기억을 토해내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나’처럼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렸다. 어느새 모녀는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금기시해온 아버지와 오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성화로 지노귀굿을 한 뒤에는 아버지와 오빠의 제사를 절에서 지내기로 한다. 아버지 기일을 맞아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은 ‘나‘. 그렇게 “이십여 전 전의 한 가족”이 모이게 되는데…….
어머니가 절에 시주하는 것, 무당을 불러 지노귀굿을 벌인 것, 이렇게 제사를 모시러 절에 찾아온 것까지 못마땅하고 불편하게만 여겨오던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아들의 위패 앞에 엎드려야 하는 욕된 배리(背理)”에도 “조용하지만 절실한 몸짓”으로 절을 하는 어머니가 그제야 제대로 보였던 것이다. 또 그들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불공을 드려온 것에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딸을 생각해서였다는 것도 깨닫는다.
딸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편안해진 어머니는 마치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이 든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 얽매임을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다.
박완서가 “오랜 얽매임을 풀고” 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일 년이 되었다. 원고지 위에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며 자기 치유를 해온 작가는 타인의 고통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소설화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사랑받아 왔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잘 아는 양 쓰는 것을 경계했던 박완서. 그래서 박완서의 작품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품어주는 땅처럼 따뜻하다. 지금은 먼저 떠나보낸 식구들을 만나 고향집 뒤란에 핀 꽃들처럼 해사하게 웃고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