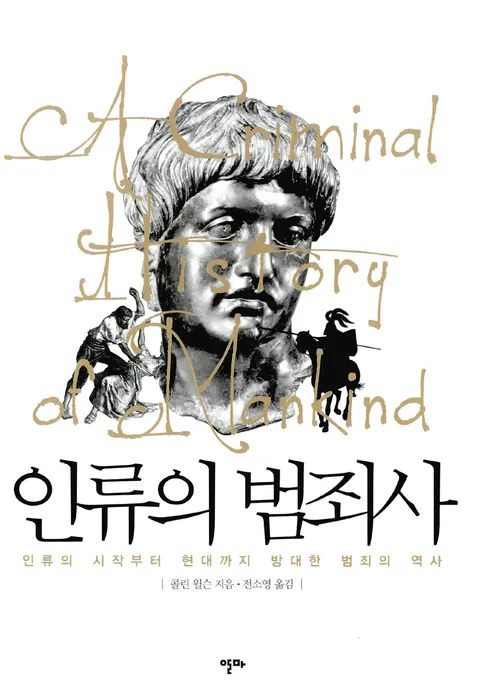“전쟁에 대한 의지는 평화에 대한 의지보다 강하다.”
_니체
인류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범죄의 역사!
범죄의 역사로 인간 본성을 통찰한 대작
이 책은 인류 초기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범죄의 현장을 샅샅이 훑으면서 인간의 범죄성과 폭력성의 근원을 탐구한 방대한 작품이다. 저자는 역사, 심리학,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철학, 문학, 뇌과학을 넘나들며,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인간은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인가?’ 더 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류 역사는 폭력과 살인, 약탈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 원시 인류의 살인 흔적에서부터 고대 제국의 황제들과 중세 기독교 교황들의 끔찍한 고문과 학살, 현대의 잔혹한 연쇄살인과 ‘묻지 마’ 살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폭력성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 책에 무수히 등장하는 인류사 속 범죄의 현장은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하여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무기(뼈 곤봉)으로 살해하는 법을 익힌 듯 보이며, 저우커우뎬周口店의 유적에서 발견된 40개의 두개골은 훼손되었고 손을 집어넣어 뇌를 파낼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어 베이징원인이 식인종이었음을 보여준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역시 식인종이라는 증거가 있다. 기원전 12세기 아시리아의 왕인 티글라트필레세르 1세는 마을을 습격해 수천 명씩 살육했고 주민들은 산 채로 사타구니부터 어깨까지 말뚝에 꿰어졌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페라이의 알렉산드로스는 사람들을 산 채로 파묻고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으며 우호 관계에 있는 두 도시의 주민을 모이게 한 뒤 에워싸고 모두 토막 내 죽였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가장 좋아했던 처형 방식은 ‘살천도殺千刀’라고도 불리는 능지처참형으로 조금씩 수천 번 살을 발라내는 형벌이었다. 네로 황제 시대 로마인은 기독교인들의 몸에 타르를 발라 기둥에 묶고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붙여 살아 있는 횃불로 사용했다. 11세기 1차 십자군원정대는 헝가리의 한 도시 주민 4,000명을 학살하고 여러 마을을 습격해 주민들을 고문하고 아기들을 쇠꼬챙이로 꿰어 죽였다. 13세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같은 기독교인인 카타르파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도시 주민 2만 명을 학살했다.
이런 예도 있었다.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인 “네덜란드의 모든 사람들은 이단자이며 따라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선언문을 공포했다. (…) 성주간聖週間 동안 800명이 처형당했다. 입에 철로 만든 재갈을 물리고 혀만 나오게 한 뒤 혀끝을 자르고 뜨겁게 달군 쇠로 지지면 혀는 입에 다시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후 그들은 불길에 던져졌다. 이 방식이 너무 시간이 걸리자 사람들을 땅에 눕힌 다음 철봉이나 도끼로 내리쳐 허리를 부러뜨린 다음 그대로 죽게 두었다. 그러려면 처형 집행인은 엄청난 힘이 필요했는데 그들도 결국 지쳐버렸다. 그래서 알바는 죄수를 세 명씩 묶은 다음 강에 집어던져 익사시키도록 명령했다. 앤트워프에서는 이 방식으로 그동안 8,000명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속도가 느렸다. 나중에 알바가 한 말에 따르면 그가 이단죄로 처형을 명령한 사람은 약 1만 9,000명이었다.”
극악무도한 개인의 사례도 존재한다. 15세기 프랑스 귀족으로 잔 다르크의 전우이기도 했던 질 드 레는 연쇄살인범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그가 가장 좋아한 변태 행위는 바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살해였다. 자신의 성으로 아이들을 유괴하거나 꾀어 들여서 목을 조르거나 베면서 (심지어 여자아이들에게도) 항문 성교를 했고 피살자들의 내장을 꺼내어 그것에 대고 자위하기를 즐겼다. 그러고는 팔다리가 절단된 시체들을 버려진 탑에 버렸다. 그가 체포된 후 그 탑에서 약 50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비슷한 시기 루마니아의 귀족이자 드라큘라의 원형인 블라드 체페슈 역시 잔혹함에서 뒤지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에서 커다란 쾌락을 느낀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괴물 중 하나였다. 1457년에 트란실바니아를 전격 공격한 그는 가장 좋아하는 처형 방식인 말뚝에 꿰어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남자, 여자, 아이를 포함한 포로들을 끌고 왔다. 나무 막대기를 항문이나 질로 집어넣어 희생자의 몸무게로 말뚝을 타고 내려와 꿰이게 만들었는데, 그는 처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막대기 끝을 너무 뾰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의 말뚝 처형은 식사 자리의 유흥거리였다.
현대 범죄의 도착성과 가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학적 성도착자자인 게오르크 그로스만은 1914~1921년에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살해한 후 희생자들의 인육을 먹고살았다. 1918~1924년 하노버의 프리츠 하르만은 약 50명의 젊은 남자 부랑인들을 죽이고 시체를 고기로 팔았다. 1928년 뉴욕의 앨버트 피시라는 노인은 10세 소녀를 목 졸라 죽이고 신체 부위를 스튜로 끓여 먹었다. 배설물을 먹고 음낭에 바늘을 집어넣은 채 바늘이 녹슬도록 빼지 않는 등 성적 괴벽을 지니고 있었고 아이들의 비명 소리에 쾌락을 느꼈다. ‘보스턴 교살자’ 앨버트 드살보는 1962년 6월부터 1964년 1월까지 13건의 성폭력 살인을 저질렀고, 200명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를 의도적으로 ‘음란한’ 자세로 ‘진열해’ 놓았다. 스타킹과 거터벨트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린 자세로 만든 뒤 질 속에는 청소용 솔 손잡이를 집어넣었다. 1973년 미국인 청년 에드 켐퍼는 14세인 1963년부터 여섯 건의 강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살해한 후 머리를 잘라내고 시체를 강간하고 해부했다. 특히 목 없는 시체와 섹스하기를 즐겼다.
그 밖에도 이 책에서 저자가 주요하게 다루는 다수의 어린 소녀를 강간 살해한 ‘황야의 살인자’ 이언 브레이디를 비롯한 현대의 잔혹한 연쇄살인범과 사이코패스 성범죄자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동기(이유) 없는 살인들, 나아가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서 벌어진 ‘인종 청소’와 고문, 납치, 자살 폭탄 테러, 비행기 납치 폭파 테러 등 인류의 범죄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인간은 동족 살해를 저지르는 유일한 동물이 되었는가?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라는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저명한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와 과학 저술가 로버트 오드리는 폭력성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로렌츠는 인간의 공격성을 스포츠나 탐험처럼 덜 위험한 취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아드리는 파괴성만큼이나 질서와 문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 역시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에리히 프롬은 아드리와 로렌츠를 반박하며 우리의 먼 조상이 원래부터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전성은 문명에 비례해 증가한다면서 인간과 문명은 서로 맞지 않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따른다. 프로이트는 문명은 인간을 언제나 좌절시키고 방해하며 신경증과 자기파괴로 몰고 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간의 범죄성은 심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범죄 자체도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변화해왔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범죄의 역사가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창한 욕구 단계설과 비슷하게 대응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초기 문명부터 19세기 초까지는 1단계인 생리적 욕구(음식)와 관련된 생존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이후 2단계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집, 안정)와 3단계인 존경의 욕구(섹스, 타인의 호감과 인정)와 관련된 주거침입이나 강도, 성범죄 등이 출현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자존감)의 욕구와 관련된 범죄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프린스턴대학교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의 ‘양원兩院 정신bicameral mind’ 이론에 주목한다. 제인스는 고대인들에게는 자의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은 신(지도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