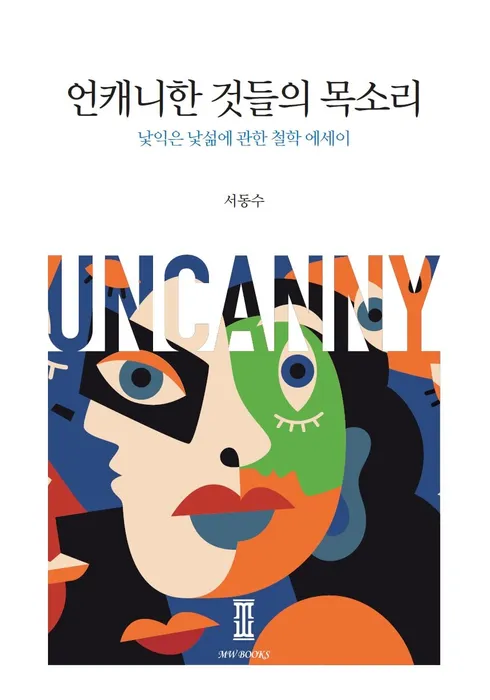
(2)
히어로와 빌런, 괴물, 신, 재난을 ‘기괴한 것들’로 바라보고 써 내려간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이트와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자, 슬라보예 지젝, 테리 이글턴, 발터 벤야민, 장-뤽 낭시, 롤랑바르트 등의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야콥 타우베스 등 신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히어로와 빌런에 대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고 있다. 히어로는 강박증자이자 도착적 쾌락에 빠져 세계의 모순을 가리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반면 근본악이라 믿었던 빌런은 헤아릴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자 제거해야 할 타자가 아니며, 빌런의 언술과 행위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잊고 있었던 것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를 아포리아의 상태로 만드는 소크라테스를 닮았다고 한다. 작가 서동수는 또한 괴물-좀비에 주목했다. 흔히 좀비를 비이성적인 존재나 소비의 쾌락에 빠진 대중에 빗대곤 한다. 하지만 좀비의 부정성을 부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비는 좀 특이한 괴물이다. 인간의 육신을 탐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괴물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좀비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마늘, 십자가 같은 금기도 없으며 먹이를 두고 경쟁하거나 서로 살상하지 않는다. 좀비에게는 권력투쟁이나 계급 갈등도 없다. 위계 없는 평등한 존재들이 무리 지어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고독한 수행자를 보는 것 같다. 모든 이를 동일자로 만드는 감염 사태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당면한 기독교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신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신은 자본의 대리인이거나 극단적 광기를 합리화해주는 기이한 존재가 되었다. 신이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자본과 교환하는 순간 자본의 권력에 포획당했다. 이제 신은 무기력 안에서 괴로워하는 우울증 환자가 된 것이다. 종교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다시 신을 사랑의 선포자로 회복시켜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언캐니한 것들의 목소리』의 마지막은 재난을 다루고 있다. 재난이라는 사태가 갖는 양가성과 이데올로기적 수행을 살피고 있다. 재난은 분명 비극적 사태이지만 그것으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재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난은 이데올로기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다. 특히 이 책은 일본의 재난 서사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왜 그토록 전통-과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머물기를 바라는지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