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외적 조건을 들고 있는데 독일의 사강사(私講師)와 미국의 조교와의 외적 조건을 비교하여 독일의 대학이 미국화되어 간다는 것과, 그러면서 독일 대학에서의 취임과 승진이 요행의
지배하에 있다고 한다.
둘째로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내적 조건을 들고 있는데, 자기의 전문에 대해 몰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학문의 사명에 관해서 고찰하고 있다. 학문과 정책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교사가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학문의 실생활에 대한 기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명석해지는 것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의 근저에는 그의 '가치로부터의 자유(Wertfreiheit)'라고 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다.
베버가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사상을 주장했던 당시의 동향은 현존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세계대전 후의 혼란과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가 충만한 당시의 청년들은 상술한 사상 동향의 지배하에
있었고, 학계에서도 또한 같은 실정이었다.
그들은 현실이 아닌 이상, 인식이 아닌 체험, 전문가가 아닌 전인, 교사가 아닌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앞서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자매편을 이루는 것으로, 베버의 대표적인 정치논문이다. 여기서 그는 정치의 개념, 지배와 그 수단, 근대국가 권력 형성, 직업정치가, 근대
관료제, 정당, 정치와 윤리의 관계 등을 논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직업정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정치를 위해서 생활하는(fur die Politik leben) 것과, 정치에 의해 생활하는(von der Politik leben)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직업정치가는 정열(Leidenschaft)과, 책임감(verantwortungsgefuhl), 목측(目測,Augenmass)이 결정적 소질이라고 한다. 정열은 일에 몰두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객관적
의미에서의 정열이다. 그러나 정열이 일에 대한 올바른 봉사가 되려면 사물에 대한 책임이 행동의 결정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 집중과 평정을 가지고 현실을 자신 위에 작용시키는 능력인
목측(目測)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은 사물과 인간을 거리를 두고 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거리를 두지 않고 사물을 본다는 것은 정치가로서는 커다란 과오가 된다는 것이다.(해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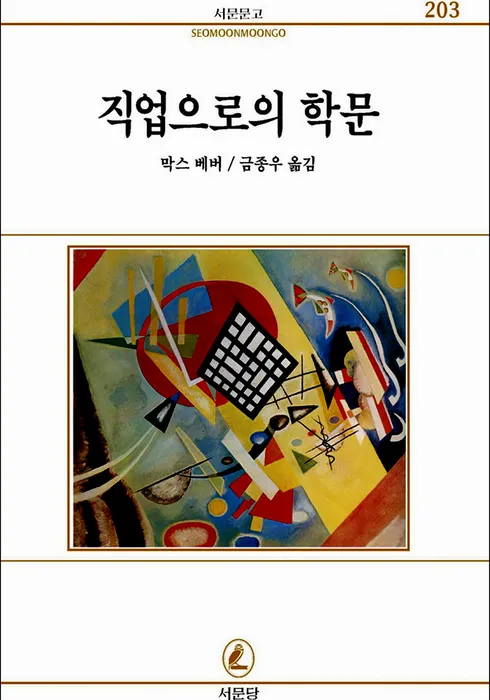
![[운영] 위키드 포 굿 3000 캐시백_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A2IjN2Kx5WyhJCLeEELo2A.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RXpNelUwTWpReU9EY3dNVFF6TnpRaWZRLjVwMkl0YjRwenhtQjdxaC02b19CbnRpalRKd1VoZUd4dnpoQ003ZGc1OGc=)
![[운영] 위키드 포 굿 3000 캐시백_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mQG10KLDToTHvO9SQS0xtg.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RXpNelUwTWpReE1qZ3lOVEkzTlRFaWZRLlU2R29zSnV0ZU9iandZdXIyT2RIUUV6VHNOTk1PTzJVcFEzbWJCZlFhb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