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 시대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현재에 갇힌 채
지금과 영원
주석
역자 후기
포에버리즘
그래프턴 태너 · 人文学
1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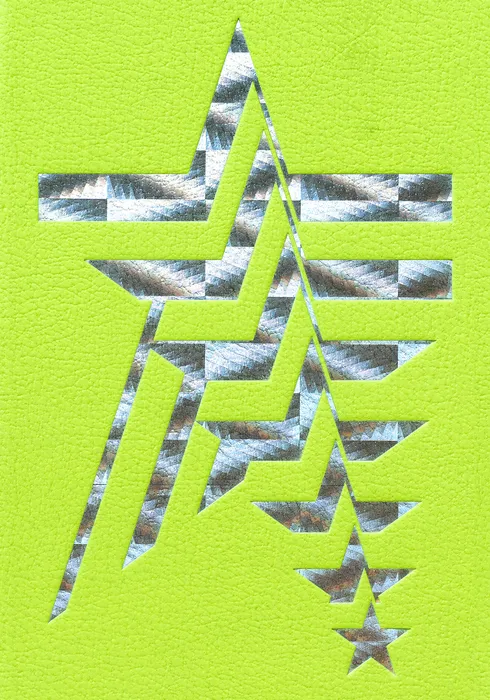
![[운영] 위키드 포 굿 3000 캐시백_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A2IjN2Kx5WyhJCLeEELo2A.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RXpNelUwTWpReU9EY3dNVFF6TnpRaWZRLjVwMkl0YjRwenhtQjdxaC02b19CbnRpalRKd1VoZUd4dnpoQ003ZGc1OGc=)
![[운영] 위키드 포 굿 3000 캐시백_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mQG10KLDToTHvO9SQS0xtg.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RXpNelUwTWpReE1qZ3lOVEkzTlRFaWZRLlU2R29zSnV0ZU9iandZdXIyT2RIUUV6VHNOTk1PTzJVcFEzbWJCZlFhbHM=)
끝없이 과거를 소환하고 존속시키는 동시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문화이론서 『포에버리즘』이 출간되었다. 노스탤지어, 기술, 자본주의 등에 관해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쳐 온 작가 그래프턴 태너는 『포에버리즘』에서 과거의 추억을 현재 그리고 미래로까지 연장시키려는 문화, 산업, 정치를 보다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영원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마법의 노래가 다시 울린다!
⟨위키드: 포 굿⟩ 최대 37%할인에 3천 캐시가 덤!
왓챠 개별 구매
마법의 노래가 다시 울린다!
⟨위키드: 포 굿⟩ 최대 37%할인에 3천 캐시가 덤!
왓챠 개별 구매
購入可能なサービス
本情報の最新性は保証されませんので、正確な情報は各プラットフォームにてご確認ください
著者/訳者
レビュー
20+目次
出版社による書籍紹介
과거가 현재에 ‘영원히’ 머문다면
동시대 문화를 수식할 때, ‘노스탤지어’는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된 듯하다. 노스탤지어를 “상실했던 무언가가 마음 속 또는 현실에 잠시 돌아왔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21쪽)이라고 정의한다면, 노스탤지어는 개인의 차원뿐 아니라 집단과 사회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노스탤지어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과 조금은 다른 특수한 현상을 본다. 과거의 무언가가 ‘잠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혹은 영원히 현재에 남아 있고자 하는 경우이다. 『포에버리즘』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이 책은 여기에 “영원주의”라는 이름을 붙인다. 영원주의란, 과거를 영원화(foreverizing)함으로써 과거를 현재 속에 계속 두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끝없는 속편과 리부트로 지속되는 시네마틱 유니버스, 모든 기록과 데이터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클라우드 아카이빙, 죽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다시 살려 내는’ 음성 복제 기술 등이 모두 영원화 기술의 일종이다.
영원주의는 일견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영원주의는 오히려 대중이 노스탤지어를 절대로 느낄 수 없게끔 예방하려 한다. 다만 근대 사회에서 노스탤지어를 억제하는 방식이 징벌과 치료였다면,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산업과 정치 권력은 영원주의적 수단들로써 여전히 노스탤지어를 근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잊히지 않고,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세계가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영원주의는 반(反)노스탤지어적 사회·문화 체제이다.
대항하려면 먼저 인식해야 한다
계속해서 리부트되는 문화 콘텐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정치, ‘영원한 존재’를 가능케 해 주는 과학기술…. 『포에버리즘』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이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는 크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과거가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갱신되는 한국의 문화와 정치 속에서 우리 또한 어딘가 기이한 느낌을 감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것은 추억 팔이, 복고주의인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노스탤지어인가?
이때 『포에버리즘』이 우리에게 ‘영원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조심스럽게 건네 온다. 혹시 영원주의가 “개념어 양산 공장이 뱉어 내는 수많은 -주의에 그저 하나를 더”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될 수도 있다.(90쪽) 하지만 그래프턴 태너의 이 개념을 받아들여 본다면, 동시대 문화에 대해 좀더 새롭고 깊은 질문들-영원주의 문화와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영원주의의 주체는 누구인가? 영원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빼앗는가?-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주의에 대항하려면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91쪽) 하며, 『포에버리즘』은 그러한 인식의 출발점이다.



さらに多くのコメントを見るには、ログインし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