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만에 부활한 스물네 권의 오래된 일기장 『흠영』(欽英)
규장각에는 스물네 권의 오래된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다. 약 200년 전 서울 남대문 근방에 살던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兪晩柱, 1755~1788)라는 이가 이 일기의 주인이다. 만 스무 살에 시작하여 서른네 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쓴 일기이니 길지 않은 그의 생애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일기는 개인의 사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18세기 서울 사대부의 일상과 조선 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매우 소상하게 담아내고 있어, 조선 후기 문학사와 사상사, 풍속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제 이 오래된 일기를 한글 번역본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재야 역사가와 자유로운 몽상가를 꿈꿨던 200년 전 젊은이의 일기를 들여다보자.
18세기 조선, ‘개인’의 발견
옛날 사람들에게 일기는 보편적인 글쓰기였을까? 현재 전하는 일기는 모두 조선 시대의 것이다. 그것도 조선 전기의 것은 3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 후기의 것이다. 익히 잘 알려진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가 바로 조선 전기의 것이다. 이 일기에는 유희춘의 개인사는 물론이고 선조 임금 당시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본격적인 일기 쓰기는 18세기 이후 뚜렷이 나타는데, 이는 시헌력(時憲曆)이라는 동아시아의 역법 체계 및 책력(冊曆)의 대중적 보급과 맞물린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상추(盧尙樞, 1746∼1829), 정원용(鄭元容, 1783~1873) 등 사대부 지식인 남성의 일기를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일기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일기들은 개인의 일생과 결부된 장편의 저술로서 짧게는 13년, 길게는 91년에 이르는 하루하루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만주가 스물한 살이 되던 1775년의 첫날에 쓰기 시작하여 서른네 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죽기 한 달 전까지 13년간 쓰고 스스로 책으로 엮어 이름붙인 일기 『흠영』(欽英)은 매우 특별하다. 노상추와 정원용이 의젓한 가장이나 관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별다른 회의를 표하지 않음에 비해, 유만주는 공사(公私) 영역을 떠돌며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기 존재에 의문을 갖고 심지어 자기 부정의 언술마저 시도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흠영』이 없으면 나란 존재도 없으며, 나는 역사책・지도・여행・주렴・다래를 좋아하며, 역사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고 헤아려 보아도 이미 어긋버긋하고 두루뭉술하고 물정을 몰라, 나긋나긋하고 세련되게 꾸미기를 요구하는 세상의 규율에 너무나 맞지 않다. 숲에서 나오지 않는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야 할 따름이다.’
유만주의 일기에는 유만주 ‘개인’이 보인다. 근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개인의 일기에 ‘개인’이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유만주 당대의 일기들을 일별해 보면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상당 부분 유만주가 경험한 정체성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으로 이어지며, 『흠영』은 이 의문에 대한 여러 층위의 탐구 및 해명을 시도한다.
우리말로 처음 번역되는 『흠영』
『흠영』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유만주가 직접 창작한 시문에서 독서한 책의 내용, 문장론,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화에 대한 논의, 조보(朝報)의 내용, 집안 대소사 등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생활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흠영』은 학계에서 18세기 사회·경제·문화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흠영』은 우리말로 번역된 적이 없었고, 이 책 『일기를 쓰다 1, 2』가 『흠영』을 우리말로 번역 소개하는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의 번역자 김하라 박사는 우리나라의 『흠영』 전문 연구자다. 박사학위 논문(『유만주의 ‘흠영’ 연구』)뿐 아니라 「『흠영』 일기에 재현된 경험적 시간의 의미」, 「한 주변부 사대부의 자의식과 자기규정」 등 유만주와 『흠영』에 대한 소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일기를 쓰다』는 『흠영』의 전체 글 중 현대의 우리에게 유의미한 글들을 선별하여 두 권으로 묶은 것인데, 1권은 일기를 통해 자기를 응시하며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한편, 책과 지식에 대한 무한한 열의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유만주 개인의 면모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수록했다. 그야말로 ‘개인’ 유만주의 발견이며 탐구이다. 2권은 18세기 조선의 아름답고도 비참한 면면을 가감 없이 기록한 글들을 모았다. 글 속에 묘사된 조선,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미시사, 풍속사의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8세기 조선 강역도와 한양 도성도에 유만주의 발자취를 표시하고 이것을 본문에 함께 수록함으로써 독자가 좀 더 공간적으로도 생생하게 18세기 조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만주의 생애와 『흠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해설과 연보는 2권에 수록했다.
역사가가 되고 싶었던 독서인 유만주
“밤에, 사관(史官)이 되는 꿈을 꾸었다.” [1787년 3월 11일 일기]
일기를 쓰기 시작한 1775년, 유만주는 서울의 남대문 근방에 거주하는 21세의 사대부 남성으로 세 살 난 아들을 둔 기혼자였으며, 별다른 공적 직분이 없는 거자(擧子: 과거 시험 응시생)로서 수시로 과거에 응시하고 낙방하던 처지였다. 유만주는 과거 급제 여부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판단하는 사회의 통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과거 시험 실패자를 바보 멍청이에 파락호로 여기는 그 통념적 시선은 이미 그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시간이 흘러도 일기를 쓰는 그의 외적 사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처지의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은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가정에서의 위치나 관료 예비군의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독서인이자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유만주가 자기 길을 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책이었다. 유만주는 몹시 아플 때나 일이 있어 외출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순간도 책을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고, 그가 본 책은 경전과 역사책은 물론 제자백가의 기이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책들, 지리서, 패관잡설, 온 세상 구석구석의 숨어 있는 괴이한 일들에 대한 기록에 이르기까지 5천 권이 넘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독서에 탐닉하며 풍요로운 내면세계를 일구어 가던 중 유만주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발견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학(史學)이었다.
유만주는 소년시절부터 역사에 흥미와 열의를 보였다. 특히 그는 일관된 시각으로 중국의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역사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집필한 책을 『흠영삼강』(欽英三綱)이라 이름 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환인씨(桓因氏)의 시대로부터 자신의 당대인 조선까지를 포괄하는 자국의 역사 편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자국의 역대 인물을 38개의 인간형으로 분류한 인물전 형식의 역사서를 기획하며 이것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넘어서는 시도가 되리라는 야심찬 포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완의 저술 『흠영삼강』은 그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국의 역사인물전은 기획에서 그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재야 역사가 유만주의 의도나 계획은 어쩌면 잠꼬대 같은 혼잣말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13년간 그의 일기에 지속된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지금의 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가 지녔던 역사 서술자로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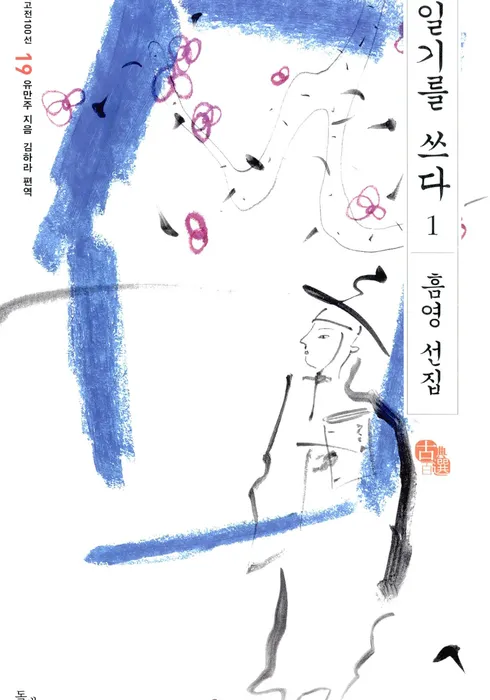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30n2nHWSAw51zVsHKabnBg.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lRBeU9USTRPRE14T1RJek9EUTNOU0o5LnJhWnI0MTlmU3o2TFBzZVVyemhLQksxRjdUZG1GMkZMYkJiWWhYVWR1cmM=)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eG_9e_QNuoozo-T-wRT1vw.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URReE56ZzBNemd6TlRFM09UUTVNU0o5Lk5oMmExaFA3U3JLeVVpZWdRbl9ET0NjSzRQMVczWExMV2RDVUR6eFVRcU0=)
돌베개 우리고전 100선 19~20권. 규장각에는 스물네 권의 오래된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다. 약 200년 전 서울 남대문 근방에 살던 사대부 지식인 유만주(兪晩柱, 1755~1788)라는 이가 이 일기의 주인이다. 만 스무 살에 시작하여 서른네 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쓴 일기이니 길지 않은 그의 생애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화 속 '주인'처럼 10대였던 시절 🏫
윤가은 감독이 사랑한 별 다섯 개 영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왓챠피디아 · AD
영화 속 '주인'처럼 10대였던 시절 🏫
윤가은 감독이 사랑한 별 다섯 개 영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왓챠피디아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