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서며-그늘
1부
그해 인천
그해 경주
두 얼굴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이문재 시인
기다리는 일, 기억하는 일
편지
그해 여수
아침밥
환절기
비
그해 협재
희고 마른 빛
벽제행
울음과 숨
꿈방
몸과 병
다시 지금은
고독과 외로움
여행과 생활
2부
내가 좋아지는 시간
그해 화암
그해 묵호
낮술
마음의 폐허
기억의 들판
해남에서 온 편지
울음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소설가 김선생님
그해 혜화동
소리들
관계
답서
사랑의 시대
3부
봄 마중
작은 일과 큰일
다시 떠나는 꽃
그해 행신
알맞은 시절
일상의 공간, 여행의 시간
광장의 한때
극약과 극독
첫사랑
우산과 비
절
취향의 탄생
그해 삼척
4부
일과 가난
불친절한 노동
어른이 된다는 것
고아
초간장
그만 울고, 아버지
손을 흔들며
축! 박주헌 첫돌
중앙의원
순대와 혁명
죽음과 유서
내 마음의 나이
해
나아가며-그해 연화리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 에세이
19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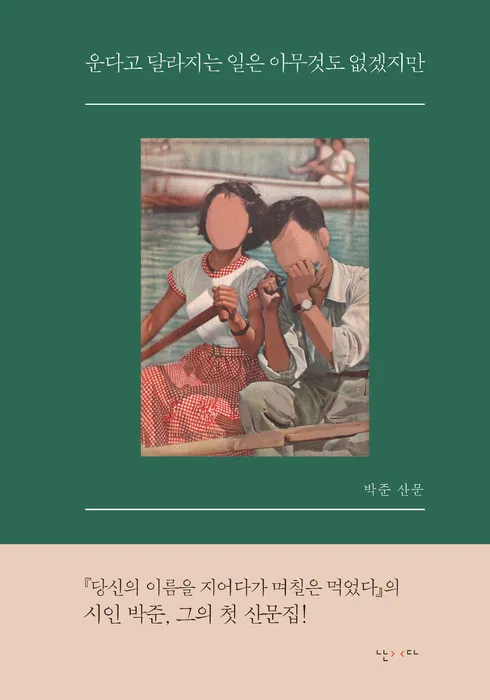
![[운영] 다를 수도 있지: 왓챠 영화주간 예매오픈_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ZNQjQU-ZHifVT7kaMyjaag.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WpJMk5qUTRPRE0yTXpVMk15SjkuRi1ZcFVuOFFuSEZXVkRpNVc3VXlYQ1BQOVc4Y2c5b1hIZWFDaUFwR2RoQQ==)
![[운영] 다를 수도 있지: 왓챠 영화주간 예매오픈_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233_20dKzLebF1jmKbxILQ.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gzTmpjek1UZzRNREl3T0RZMU9UTWlmUS5FaGxkQnFEc1JRVGYtZDVVS2MzMnUtMXAycmd5VDBqNndSdmk1V1RaNE1F)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시인 박준, 그의 첫 산문집. 박준 시인이 그간 제 시를 함께 읽어주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되새겨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한 권의 답서이자 연서이다. '시인 박준'이라는 '사람'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총 4부로 나뉘어 있지만, 그런 나눔에 상관없이 아무 페이지나 살살 넘겨봐도 또 아무 대목이나 슬슬 읽어봐도 그 이야기의 편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글이다. 드러낼 작정 없이 절로 드러난 이야기의 어린 손들을 우리들은 읽어가는 내내 잡기 바쁜데 불쑥 잡은 그 어린 손들이 우리들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으로 적어주는 말들을 읽자면 그 이름에 가난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더불어 이 책은 시와 산문의 유연한 결합체임을 증명해 보인다. 어느 날 보면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히고 또 어느 날 보면 한 권의 산문으로 읽힌다. 특히나 이번 산문집에서는 박준 시인만의 세심하면서도 집요한 관찰력이 소환해낸 추억의 장면들이 우리를 자주 눈물짓게 한다.
왓챠의 열 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다를 수도 있지: 왓챠 영화 주간’ 예매 오픈!
왓챠
왓챠의 열 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다를 수도 있지: 왓챠 영화 주간’ 예매 오픈!
왓챠
구매 가능한 곳
본 정보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자/역자
코멘트
600+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시인 박준, 그의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
그냥 옆에 있는 책.
마냥 곁이 되는 책.
가끔 사는 게 힘들지? 낯설지?
위로하는 듯 알은척을 하다가도
무심한 듯 아무 말 없이
도다리 쑥국이나 먹자,
심드렁히 말해버리는 책.
1.
박준, 이라는 이름의 시인을 압니다. 2008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지난 2012년에 첫 시집을 상재한 바 있다지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시집 제목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그래요『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초콜릿색 시집이요. 뒷면에 한 여인의 뒷모습을 짐짓 무심한 듯 그러나 뭔가의 사연을 짐작케 하는 포즈로 새겨넣었던 바로 그 시집이요. 참으로 큰 관심 속에 이 시집은 세상에 선을 보인 지 5년을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꾸준한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산다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박준 시인은 뭐든 잘 잊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들을 확인할 때마다 제 안에 꼬깃꼬깃 접어 숨겨놓았다가 뭔가 아리송한 바람이 저를 덮칠 때면 외따로이 숨어 앉아 몰래 꺼내보고는 한다지요.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나요.
2.
그런 그가 오랜 준비 끝에 첫 산문집을 들고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첫 시집 제목이 열여섯 자였는데 그보다 한 자 더 보태 열일곱 자 제목으로 짓고 기운 책으로 말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가만, 제목이 좀 길죠? 네, 좀 길다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리 어렵게는 안 느끼실 거다 자신했던 데는 우리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봤거나 들어봤을 경험의 소유자들이라는 까닭에서였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더는 울지 마, 하는 사람이 나였다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더 좀 울어, 하는 사람이 너였던 상황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놓여 있었던가요.
3.
앞서 ‘편지’라는 단어를 살짝 꺼냈었는데요, 이번 박준 시인의 산문집이 어쩌면 편지라는 설명 불가결의 의미심장함과 참으로 닮아 있다 싶기도 해요. 왜 편지가 그렇잖아요. 억지로 쓰게 되면 빤하고 밋밋한 소리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쓰게 되면 손에 펜을 쥔 자가 예측 불허의 무한 에너지로 제 안의 이야기들을 마구 터뜨리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중간 중간 추임새처럼 섞어가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나길 진실인 편지,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길 진심인 편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박준 시인이 그간 제 시를 함께 읽어주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되새겨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한 권의 답서(答書)이자 연서(戀書)가 아닐까 해요. 그런 둘 사이의 편지는 필시 길게 이어질 운명이라는 것도 실은 조금 알겠어서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마음이 보다 덜 부담일 수도 있던 바, 분노나 미움보다 애정과 배려에 가까운 것이 편지이기에,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는 시인의 바람이 실은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쓰고 싶다는 마음과 동일한 다짐임을 알기에, 시인은 타고난 부끄러움을 돌로 살짝 눌러놓은 채 이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써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퍼내서요, 더는 남음이 없어요! 원고를 마무리 지으며 시인이 뱉은 말을 끝끝내 원고 마지막 페이지에 압정으로 꽂아두었던 저라지요.
*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이니 가난한 남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이니 이별을 앞둔 연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이니 죽음을 공유한 부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시인 박준’이라는 ‘사람’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글입니다. 제 호흡 가는대로 총 4부로 나누긴 하였지만 그런 나눔에 상관없이 아무 페이지나 살살 넘겨봐도 또 아무 대목이나 슬슬 읽어봐도 우리 몸의 피돌기처럼 그 이야기의 편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드러낼 작정 없이 절로 드러난 이야기의 어린 손들을 우리들은 읽어가는 내내 잡기 바쁜데 불쑥 잡은 그 어린 손들이 우리들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으로 적어주는 말들을 읽자면 그 이름에 가난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생활, 이별이라는 정황, 죽음이라는 허망, 이 셋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직면한 과제라 허투루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가능하면 피하고만 싶었던 우리들의 민낯, 그 가난은 힘들고 또 힘들게 하고, 이별은 아프고 또 아프게 하고, 죽음은 슬프고 또 슬프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맞장을 뜨듯 이 삶의 곤궁더미들을 미리 대면하면 좋을 이유가 우리 몸에 내성이라는 것을 생기게 함으로써 끝끝내 삶을 밀어 삶 너머로 나아가게 할 것을 아니까요, 그 원동력으로 삶과 죽음의 쳇바퀴를 더욱 자신 있게 굴리게 해줄 테니까요.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나 하는 물음에 우리가 왜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물음이 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과 확신, 이 책으로 말미암을 수 있었다니까요.
5.
더불어 이 책은 시와 산문의 유연한 결합체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어느 날 보면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히고 또 어느 날 보면 한 권의 산문으로 읽힙니다. 문장 하나 허투루 쓰인 것이 없으니 내가 그은 밑줄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날 잦게 합니다. 이상하지요. 강요하는 말씀이나 주저앉히는 감상을 싹 다 걷어낸 담백한 글인데 울음 끝에 웃음이거나 웃음 뒤로 울음인 그 둘의 뒤섞임이 왕왕입니다. 특히나 이번 산문집에서는 그만의 세심하면서도 집요한 관찰력이 소환해낸 추억의 장면들이 우리를 자주 눈물짓게 하였는데요, 이를 구성케 한 그만의 특별한 기억력에 나는 뭔가 들킨 적이 없나 놓친 것은 없나 몇 번이나 되새김질을 해야 했답니다. 장난감처럼 보여도 실은 고성능으로 무장된 레이더를 제 안에 장착한 것만 같은 시인 박준. 아이처럼 말하는데 어른처럼 보는 시인 박준. 어쩌면 조금 이르다 싶게, 제법 익숙하다 싶게, 터무니없이 갑작스럽다 싶게 겪은 세상의 풍파 속에 시인이 앳된 나이부터 노출이 된 까닭도 있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시인은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그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 누구를 불신하지도 않는 삶의 태도로 씩씩합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는 듯 우리가 누구나 홀로인 것은 맞으나 언제나 혼자인 것은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껌 종이에 적은 메모처럼 쥐어주기도 하지요. 속고 속으면서 살다 가는 것이 또한 삶이 아니겠냐며 울다 웃고 또 웃다 우는 것이 인생 아니겠냐며 지친 우리들의 등을 말없이 쳐주다 슬쩍 사라지기도 하지요. 아무래도 우리와는 다르게 눈 하나를 더 가진 사람, 그래서 일반인으로는 저주를 받았다 할 수 있겠으나 시인으로는 복을 받은 이가 바로 박준 시인이 아닐까 해요.
6.
이 책은 읽는 내내 우리와 보폭을 정확히 맞춰줍니다. 까만 뒤통수를 내보이며 앞서 가는 책도 아니고 흰 얼굴로 흐릿하게 멀어지며 뒤로 가는 책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책입니다. 마냥 곁이 되는 책입니다. 가끔 사는 게 힘들지? 낯설지? 위로하는 듯 알은척을 하다가도 무심한 듯 아무 말 없이 도다리 쑥국이나 먹자, 심드렁히 연인에게 말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벤허> 단체관람을 간대. 나는 못 갔지. 돈이 없으니까”, 하는



더 많은 코멘트를 보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