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해제: 토마스 아퀴나스 전체 사상의 설계도 『존재자와 본질』 9
옮긴이의 말 49
서론 61
제1장 존재자와 본질 개념의 일반적 의미 83
제2장 복합 실체에서 발견되는 본질 139
제3장 본질의 유, 종, 종차에 대한 관계 211
제4장 단순 실체의 본질과 존재 257
제5장 신과 지성 존재들과 영혼의 본질과 특성 327
제6장 우유 385
참고문헌 439
토마스 아퀴나스 연보 465
찾아보�기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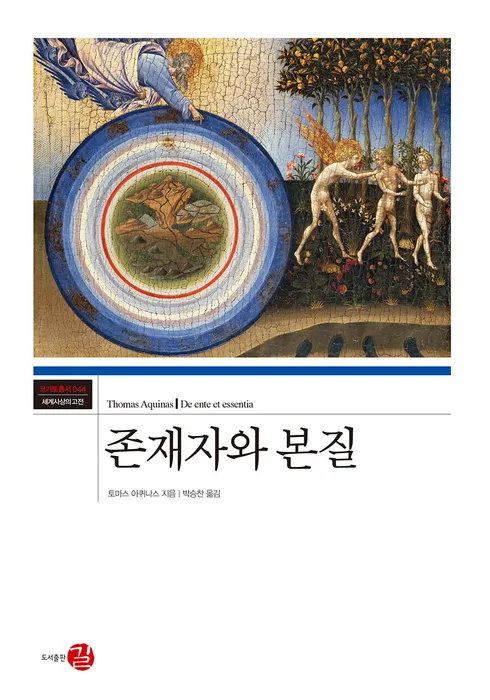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세계로 들어가는 최적의 입문서이자 그의 철학 전체의 설계도.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 있어 존재자와 본질은 이 책의 번역자인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철학)의 언급대로, 토마스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사상의 설계도 구실을 하기에,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방대한 그의 사유 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접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의 문 열어볼까요?
코고나다감독 판타지 감성 시네마
빅 볼드 뷰티풀 · AD
기억의 문 열어볼까요?
코고나다감독 판타지 감성 시네마
빅 볼드 뷰티풀 · AD
저자/역자
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세계로 들어가는 최적의 입문서이자 그의 철학 전체의 설계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순히 서양 중세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상적 거장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신학대전』과 『대(對)이교도대전』은 방대한 분량에서 뿐만 아니라 명석한 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서양 사상의 두 뿌리인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성공적으로 종합해 냈다는 평가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명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그의 사상적 지평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영원의 철학’(philosophia perennis)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특히나 서양 철학이 태동할 때 가장 먼저 물었던 “모든 사물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사유 지평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그 독창성과 심오함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존재’와 ‘본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음 전면에 부각시킨 철학자로 각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 시기까지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하나’(一)와 ‘많음’(多), ‘변화’와 ‘불변’(不變), 동(動)과 부동(不動)의 문제와 같이, 아직까지는 ‘존재’와 ‘본질’의 구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철학적 유산과 당대 이슬람 사상의 최전선이었던 아비첸나(Avicenna)의 철학 방법론을 가져와 자신만의 독특한 형이상학 토대를 구축한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 있어 『존재자와 본질』은 이 책의 번역자인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철학)의 언급대로, 토마스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사상의 설계도 구실을 하기에,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방대한 그의 사유 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접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essentia)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존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 세계에서 초창기 저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학문 동료와 후학들을 위해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시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 학자들의 저술과 대학 강의실에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었지만 통일된 의미가 제시되지 않아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학문 탐구에 도움을 주고자 ―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철학적인 근본 개념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이 바로 이 책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초기의 저작이기는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후 사상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사유의 씨앗들이 이 책에서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즉 이 책에서는 형이상학은 물론이거니와 논리학, 인식론, 신존재증명(또는 신론神論), 자연철학, 철학적 인간학 등이 포괄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 소책자의 주제는 ‘본질’(essentia)이라는 개념과 이 본질이 존재 또는 논리적 개념들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토마스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각각의 실재하고 있는 사물들에서, 특히 물질적 실체들 안에서 본질의 특성이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실체적이거나 우유적인 다양한 실재의 영역에서 유(有), 종(種), 종차(種差) 같은 논리적 개념들은 본질과 관련해 무엇을 표시하는가? 우리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개념들의 도움으로 정의(definitio)를 구성하는데, 이 정의의 대상이야말로 바로 본질이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우 많은 이전 사상가의 입장을 때로는 수용적으로 때로는 비판적으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주제에 부합하게 본질 개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아비첸나의 사상을 주로 수용한다. 토마스가 이 책을 저술하던 1250년대에는 아비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토마스는 본질 개념과 그것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원천을 해명함으로써 학생과 동료들에게 당시의 토론이 지니고 있던 중요성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전 사상가들의 논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욱 심오한 사상인 ‘존재의 형이상학’이라는 자신의 철학 세계로 이끌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존재자와 본질의 명칭으로 무엇이 의미되는지를 고찰했다. 남은 다섯 개의 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물들에서 어떻게 본질이 발견되는지를 고찰했다. 우선 둘째 부분(제2~3장)에서는 복합 실체들을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복합 실체의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어서 복합 실체의 본질이 어떠한 근거에서 서로 다른지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복합 실체의 본질이 논리적 개념들, 즉 유(有)와 차이(差異)의 개념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부분(제4~5장)에서는 단순 실체의 본질과 존재를 다룬 이후에 신, 창조된 지성적 실체, 질료와 형상으로 합성된 실체에서 본질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는가를 밝힌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 실체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적용해 우유가 지닌 독특한 성격을 설명한다.
이러한 순서로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토마스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에 기반한 복합 실체와 단순 실체의 구별, 물질적이건 비물질적이건 간에 모든 피조물의 신적 존재에의 참여, 제1질료의 순수 가능성, 복합 실체의 개체화의 원리인 지정된 질료, 단순 실체들의 물질적 본성의 배격,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논리적 개념과 추상적 형상의 실존하는 개별 실체에 대한 의존성, 창조된 본질과 존재 사이의 실재적 구별, 실체와 구별되는 우유의 속성들 등이 해명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뛰어넘어 서양 철학에 ‘존재의 형이상학’의 초석을 놓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사실 이 책의 서론부터 제6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실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모든 피조물이 본질과 존재로 합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존재자들의 궁극적 근원인 자존하는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그 목표를 위해 그는 복합 실체와 감각적 물질세계에서 단순 실체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즉 모든 피조물을 실재적으로 구별되는 형상과 존재의 합성, 다시 말해 본질과 존재의 합성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합성된 존재는 모두 그러한 합성을 야기한 존재의 원인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원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존재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제1원인인 신(神)을 순수 존재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존재를 분유받아 존재와 본질로 합성된 단순 실체와 복합 실체의 구별을 완성했다. 그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제1원인, 즉 존재와 본질이 같은 존재, 자존하는 존재 자체(ipsum esse subsistens)에 도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이로써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뛰어넘어 본래의 존재론, 즉 모든 존재자의 기초로 삼는 이른바 ‘존재의 형이상학’의 초석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