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하여
브뤼셀의 한 가족
부록
파자마 인터뷰
옮긴이의 글
샹탈 아케르만 연보
브뤼셀의 한 가족
샹탈 아케르망 · 소설
1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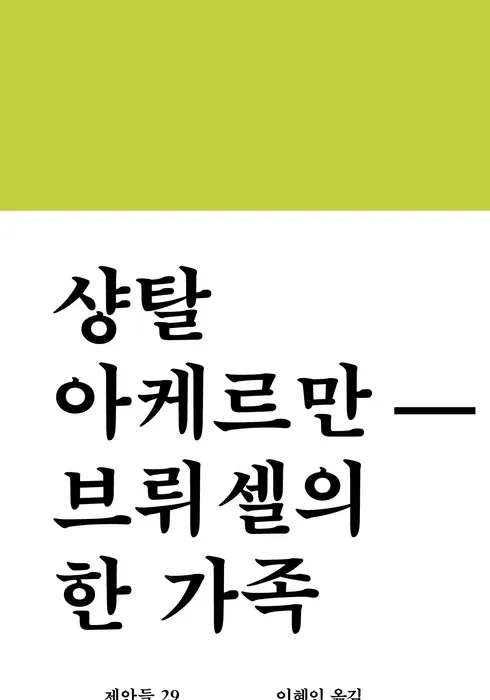
워크룸 문학 총서 ‘제안들’ 29권.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영화감독 샹탈 아케르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글은 그의 첫 소설이기도 하다. 한국어판에는 샹탈 아케르만의 영화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긴 인터뷰를 부록으로 실었다. 『브뤼셀의 한 가족』은 제목 그대로 브뤼셀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듯 바라본다.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다시 브뤼셀의 거의 텅 빈 넓은 아파트를 바라본다. 통상 가운을 입고 있는 여자 한 명만 있는 그곳을.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여자.”(11쪽)
구매 가능한 곳
본 정보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자/역자
코멘트
10+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샹탈 아케르만의 『브뤼셀의 한 가족』(이혜인 옮김)이 워크룸 문학 총서 ‘제안들’ 29권으로 출간되었다.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영화감독 샹탈 아케르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글은 그의 첫 소설이기도 하다. 한국어판에는 샹탈 아케르만의 영화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긴 인터뷰를 부록으로 실었다.
말과 글
『브뤼셀의 한 가족』은 제목 그대로 브뤼셀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듯 바라본다.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다시 브뤼셀의 거의 텅 빈 넓은 아파트를 바라본다. 통상 가운을 입고 있는 여자 한 명만 있는 그곳을.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여자.”(11쪽)
‘나’는 ‘여자’를 계속 바라본다. 내가 바라보는 여자는 텔레비전 앞 소파에 누워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다. 마침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고, 문장은 자연히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여자는 남편을 잃었고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딸이 둘 있다. 그리고 가깝고 먼 친척들과 오가며 지낸다. 이어지는 문장들은 이 가족을 둘러싼 이런저런 서술을 조금씩 흘려 가는데, 누군가가 기억나는 대로 또는 말이 나오는 대로 쓴 듯한, 구어체에 가깝게 진행되는 글은 떠오르는 대로 말하다 보면 종종 횡설수설하게 되듯이 뒤섞이고 길게 늘어진다. 그러다 어느새 화자가 바뀌어 있기도 하다. ‘나’와 ‘그녀’는 때로는 딸이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는데, 이러한 화자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곱씹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이 글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는 듯한 문체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한 남자의 죽음이, 홀로코스트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의 면면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소설과 영화
브뤼셀의 한 가족에 대해 제법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 이 소설의 글쓰기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듯한 인상”(「옮긴이의 글」 중에서)이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알려진 만큼 이미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서사를 조각내듯 펼쳐지는 문장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말과 글이 혼재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글은 한때 실제로 존재했다고 알려진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분명히 소설의 양식을 취한다. 내밀하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 그 양극단을 오가며 “종종 꾸민 듯 들리지만 가끔은 진짜 같기도”(11쪽) 한 진술이 쓰여 가며, “내 생각에는 내 딸이 이 이야기를 모두 지어낸 것 같았다”(76쪽)는 말은 “내 딸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 모두가 진실은 아니지만 개중 진실인 것도 있고 그건 보통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보다는 슬픈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 애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기억이 날 때면 웃긴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들도 항상 진실은 아니지만 가끔 진실이기도 하다.”(76쪽)는 열린 문장으로 이어진다. 소설의 픽션적인 속성을 이용해 필요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듯 보이는 글은 이를테면 가까이 들이댔던 카메라의 렌즈를 다시 뒤로 빼듯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대상과 거리를 두는 시선은 “도입부에서만 영화 「잔 딜만」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 서술 방식에서도 표면적인 묘사에 머물면서 인물과의 거리를 없애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케르만의 영화와 닮았다”(「옮긴이의 글」 중에서).
『브뤼셀의 한 가족』은 말, 글, 소설, 영화 등 이야기를 담는 여러 매체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다.



더 많은 코멘트를 보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