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 말
0부 하루를 더 사는 일은 한 명의 사라진 나를 두 명의 사라진 나로 만드는 일이다
봄 학기 | 눈사람에게 공장을 돌리게 하자 | 시계탑
1부 열아홉의 내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싶어서 삼십 년을 살았다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
2부 음악을 모르는 것처럼 피아노는 흰색과 검은색을 가졌을 뿐인데
독주회 | 수요일의 주인 | 작사가 | 연애 | 화전 | 토키 영화 | 여성안심귀갓길 | 러시아워 | 공평한 사랑 | 분실물 보관소 | 외시경
3부 할인 마트 간판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면 나는 냉동육과 가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미래 중독
4부 이제 내려가요 밥 먹을 때잖아요
무지개 비 | 잠만 자겠습니다 | 가로 | 대여된 잠 | 델몬트 유리병 | 북해어 | 침묵을 본뜬 것처럼 | 유례 | 공가 | 하루 | 옥상의 조건
5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이 오는 것처럼
목항 | 부여라는 곳 | 목격자 | 오월에서 사월로 무지개가 | 광주 | 백제 수업 | 우금치 | 저자 | 농공 단지 | 연무일
6부 평생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도 늙어 죽겠지
마모 | 퇴식구 | 앵무새 둥지
7부 제 몸속의 아이들을 침묵 속에 가두느라 어금니가 상해버린 마법사
포인트 니모
발문
슬픔과 돌 · 송종원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
신용목 · Poem
19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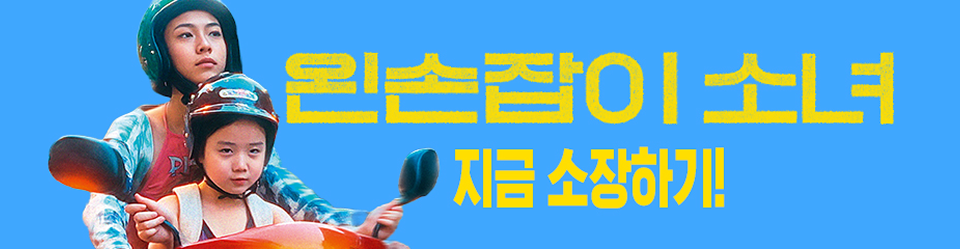

슬픔에 적극적으로 침잠함으로써 서정과 사회를 연결해온 시인 신용목의 일곱번째 시집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가 문학과지성 시인선 606번으로 출간되었다. 전작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문학동네, 2021) 이후 3년 만에 묶는 시집으로, 마흔한 편의 시가 총 여덟 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첫 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문학과지성사, 2004)가 세상에 나온 지 꼬박 20년이 흐른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왼손으로 쓴 삶, 용기를 묻다
흔들리는 카메라가 선명하게 붙잡은 삶
왓챠 개별 구매
왼손으로 쓴 삶, 용기를 묻다
흔들리는 카메라가 선명하게 붙잡은 삶
왓�챠 개별 구매
Where to buy
본 정보의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Author/Translator
Comment
10+Table of Contents
Description
“그때 알았을까,
어쩌면
내 몸은 삼십 년을 뚫어놓은 구멍이라는 것을”
평범해서 결코 당연하지 않은 미래
그 우연 속에 사랑하는 ‘우리’가 있어서
먼바다의 파도를 타고 오늘로 돌아온 시인
신용목 일곱번째 시집 출간
슬픔에 적극적으로 침잠함으로써 서정과 사회를 연결해온 시인 신용목의 일곱번째 시집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가 문학과지성 시인선 606번으로 출간되었다. 전작 『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문학동네, 2021) 이후 3년 만에 묶는 시집으로, 마흔한 편의 시가 총 여덟 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첫 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문학과지성사, 2004)가 세상에 나온 지 꼬박 20년이 흐른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열아홉의 내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싶어서
삼십 년을 살았다
내 미래는 이런 거였구나, 이제 다 보았는데
돌아가서
알려주고 싶은데, 여전히 계속되는 시속 한 시간의 시간 여행을 이제 멈추고
돌아가서
알려주면, 열아홉의 나
자신 앞에 놓인 삼십 년의 시간을 살아보겠다 말할까
아니면
살지 않겠다 말할까
―「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 부분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므로 늘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저 주어진 당장을 살아가기. 얼핏 시시하고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평범이 곧 평온은 아니다. 현재를 살아 미래로 가는 일은 “울음소리”와 “닿지 않는 분노”(「목항」)를, “나를 키운 모든 욕망”과 “나를 죽인 모든 것”(「오월에서 사월로 무지개가」)을 끊임없이 통과하는 일이다. 그 한가운데에서 “어금니가 다 상해버”릴 정도로 꽉 입을 다물어 “몸속의 아이들을 침묵 속에 가두”(「포인트 니모」)어야 하는, “내 속의 아이가 깨지 않기를/그래서 울지 않기를/바”라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살아남은 미래의 ‘나’는 이제 과거의 ‘나’가 보고자 했던 미래가, 즉 ‘나’의 현재가 지난한 과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안다. 이토록 우연히 미래에 놓인 생존자로서, 열아홉의 마음을 품은 채 30년을 지나온 시인은 의문을 던진다.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절의 ‘나’에게 앞으로의 시간이 어떠한지 일러주면, 그는 “살아보겠다 말할까/아니면/살지 않겠다 말할까”(「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
대답의 내용이 어떻든 ‘나’는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우금치」), “미래는 이런 거였구나, 이제 다 보”(「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고 난 뒤 삶에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아침”(「가로」)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이어가야 하는 “내 몸은/뾰족하게 깎은 인생으로//시간을 뚫어놓은 구멍”이다. 다만 이 구멍은 결손이나 상흔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드나드는 통로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회오리치는 사랑”이 기운차게 그 내벽을 “붉은 피로 돌”(「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며 몸을 한껏 열어젖혀 헤집을 것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파헤쳐진 몸은 내 것이어도 나만의 것은 아니”(「독주회」)다. 우연한 미래에 있는 것은 ‘나’가 아닌 “사랑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 우리”(「수요일의 주인」)다.
“나의 조상은 몽상가가 아니라
노동자였습니다”
꿈이란 잠 바깥에 있는 것
부단히 움직여 만들어야 하는 것
이제 고백하자. 나는 죽은 사람이 살던 집에서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쓰는 사람.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쓰던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죽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쓰며 사는 사람.
하지만
이건 악몽이고, 악몽은 잠 속에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중독」 부분
시집의 중간께인 3부에 자리한 「미래 중독」은 열 개의 이미지가 이어져 흐르는 장시로, 이번 시집의 중요한 키워드인 ‘미래’에 대해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충실하게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긴 그림자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을 통해서만 미래에 다다를 수 있으므로, 미래에 중독되는 일은 곧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중독”됨이나 다름없다.
실현되지 않은 시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미래’는 ‘꿈’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때 꿈은 ”죽은 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는 어디에도 없”(「우연한 미래에 우리가 있어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나는 죽은 사람이 살던 집에서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쓰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쓰며 사는 사람”(「미래 중독」)임을, 즉 현재가 미래의 재료이자 과거의 구성체임을 감각할 때, 꿈은 잠 바깥에 놓여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깨지 않는”(「앵무새 둥지」)다.
그러므로 꿈은 “잠들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다. “누군가 여보시게, 그냥 잠들어도 괜찮네 어깨를 두드”려도 잠 밖으로 나와 깬 채로 만들어야 하는 지금 여기의 몫이다. “꿈속의 내가 꿈 밖의 나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것”(「미래 중독」)인 몸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제조품이다. 몽상가가 아닌 노동자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혀끝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느 날 꿈을 꾸며 미래라는 공산품을 만”(뒤표지 글)든다.
“사실 빛은 돌이었고
사실 빛이 통과할 때마다 매번 유리는 깨진다”
부서짐으로써만 닿을 수 있는 돌의 바닥
그곳에서 빛나는 미지의 내일
작고 거친 돌 하나가 있어
나는 훔친다
그 순간, 나를 가져버린 것을 내가 가져가는 전능을 보여준다
나는
창을 닦는다 부싯돌을 부시듯 행성의 모서리가 반짝인다
불을 켠다 부싯돌을 던지듯
어둠이 쓰러진 바닥에서 연신 매운 눈을 비비며, 불을 부는 사람의 빨간 눈을
보고 싶어서
주워 온 돌을 창가에 놓는다
―「여성안심귀갓길」 부분
이번 시집의 발문을 쓴 문학평론가 송종원이 짚고 있듯, ‘돌’은 신용목의 작품 세계에서 ‘불’ ‘재’ 등과 함께 구심점을 이루며 “단단한 구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이 돌은 한군데에 가만히 놓여 있는 대신 “내달리다 쓰러”(「토키 영화」)지고 “마음먹고 던”(「북해어」)져지는 등 이리저리 움직이며 세계와 부딪는다. “생각의 조각들”이 “사방으로 터져 나”(「미래 중독」)가듯, “너의 말 속에서” ‘너’가 “매번 깨”지듯, 돌은 “쿵, 어둠 속으로 떨어”져 “오직 깨지면서 자신의 바닥을 고백”(「토키 영화」)한다.
미래는
공중에 숨어 있던 포물선을 잠시 보여주고 떨어지는 돌멩이의 유일한 바닥,
그곳에 쓰러져 있다
―「포인트 니모」 부분
‘돌’은 “몸에서 잠을 꺼내”고 “잠에서 꿈을 꺼내 뭉쳐놓은 것”(「광주」)이므로, 그것이 고백한 밑바닥에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미지의 영역에 뉘어 있는 진짜 미래, 아무도 닿지 못하는 먼바다 복판의 지점 ‘포인트 니모(Point Nemo)’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산산이 부서지며 ‘발화(發話)’를 시작한 돌은 이내 제 “유일한 바닥”에서 ‘발화(發火)’하며 빛이 된다. 돌이었을 때 유리(琉璃)를 “와장창” “깨뜨”렸던 것처럼, 빛은 “통과할 때마다 매번”(「여성안심귀갓길」) 유리(遊離)를 깨뜨리며 “슬픔을 빼앗”(「광주」)는다. “바닥에 던져진 별빛”은 그렇게 가장 낮은



Please log in to see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