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d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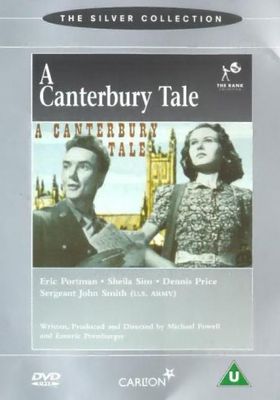
캔터베리 이야기
평균 3.8
2025년 03월 07일에 봄
(이 글은 아무나 읽어도 상관없지만 특히 영화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이 더 읽어주기를 바란다.)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마지막으로 상영되는 마이클 파웰, 에머릭 프레스버거의 걸작 <캔터베리 이야기>(1944)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늘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되는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는 한 여성의 얼굴 클로즈업 쇼트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얼굴 클로즈업 쇼트가 나오는 영화가 바로 <캔터베리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에서 그 얼굴 클로즈업 쇼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쇼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쇼트가 눈 앞에 나타났을 때 감흥이 더 클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영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인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의 현대판이라고 할 만하다. 보다 정확하게는 2차 대전 시기에 캔터베리 대성당 부근의 한 시골 마을에 머물게 된 세 명의 순례자에 관한 이야기다. 세 명의 순례자는 각각 미국 군인 밥, 영국 군인 피터, 영국인 여성 앨리슨이다. 이 세 명은 마을에서 계속 벌어지는 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면서 각자의 순례의 여정을 밟게 된다. 개인적으로 <캔터베리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 가장 훌륭한 기독교(적) 영화 중의 한 편이다. 내가 신학도는 아니지만 내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는 바람직한 영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식의 프로파간다적인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안적인 기독교 영화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나는 기독교적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 내 스스로도 이런 류의 기독교 영화에 도전해보고 싶다. 물론 파웰과 프레스버거는 기독교를 의식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중세 시대에 순례자의 여정을 다룬 '캔터베리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삶에 접근한 영화를 찍고자 했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 같은 크리스천에게도 감동을 줄 만한 영성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는 작품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작품이다. 영화가 밤에 시작하고 주변이 유난히 더 어두운 것은 전시 상황에서의 등화관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단순히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대비라는 영화의 근원적인 속성과도 연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둠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영화가 에드워드 양의 걸작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1991)인데 <캔터베리 이야기>도 이 영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어둠은 또한 세 순례자의 마음의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다. 각각의 인물들은 각자만의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 속의 어둠은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은총이 도래하면서 빛 가운데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순례자의 여정에 동참해온 관객들 각자의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임할 것이다. <캔터베리 이야기>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군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영국의 검열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설정은 순례자를 떠올릴 때 자연스러워보이는 측면이 있다. 신 앞에서는 어떤 신분이 되었든지 간에 순례자라는 점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는 파웰, 프레스버거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가장 아름답다고 할 만한 대장간 시퀀스가 있다. 대장간 시퀀스는 공동체를 빼어나게 그려내는 대가들인 존 포드나 장 르누아르의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 시퀀스는 앨리슨과 밥이 마차를 수리하는 대장간 주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시퀀스가 아름다운 것은 영상미나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마치 신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카메라가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인물의 쇼트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경이롭다. <캔터베리 이야기>는 영리한 구성으로 전개된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접착맨'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고 영화는 밤마다 여성들의 머리에 끈적거리는 액체를 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과정을 따라간다. 이러한 추리 구조는 전반적으로 느린 호흡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루해질 수도 있는 이 영화에 최소한의 긴장감을 부여한다. 주로 밥, 피터, 앨리슨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소묘하듯이 보여주는 이 영화에는 인물들이 과거의 순례길을 걷거나 마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마을의 풍경을 보는 장면들이 있다. 이 장면들을 통해 관객도 이들과 함께 걷거나 마을의 풍경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 명의 순례자로서 그들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얼굴 클로즈업 쇼트가 등장하는 바로 그 시퀀스에서 앨리슨이 순례길을 걷는 도중에 과거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정말 압권이다. 다소 느슨하게 전개되는 것 같던 영화의 모든 일들은 영화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고 대성당에 도착한 밥, 피터, 앨리슨 그리고 그동안 그들의 순례의 여정에 동참했던 관객 모두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각자의 인물들에게 도래하는 작은 기적들은 거창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밀하게 각자의 삶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게 만든다.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접착맨'도 대성당에 있다.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를 아마도 신은 용서할 것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과도 만난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과거의 순례자들도 밥, 피터, 앨리슨과 같은 은총의 순간을 맞이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의 순례자들의 여정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순례자이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영화인 <캔터베리 이야기>와 함께 순례자의 여정에 동참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