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죽음을 부정하다
유사 죽음의 시대
도시 묘지의 행방불명
불가분적 관계에 대하여
2_ 죽은 자와 산 자를 잇다
두 번째 집
망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
파리, 이노상, 향수
내 죽으니 그리 좋나!
3_ 묘지, 추방되다
공간은 살해당했다
조각난 도시
도시와 묘지의 적정 거리
죽음의 풍경이 사라진 도시
4_ 파리와 서울에서 죽다
파리의 묘지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서울, 추방당한 죽음
다시, 죽음에게 말 걸기
에필로그 ; 묘지에서 삶을 보다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죽음을 기억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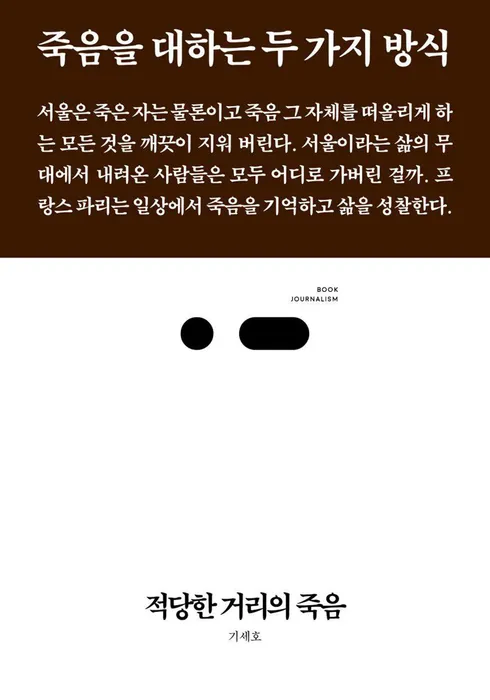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30n2nHWSAw51zVsHKabnBg.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lRBeU9USTRPRE14T1RJek9EUTNOU0o5LnJhWnI0MTlmU3o2TFBzZVVyemhLQksxRjdUZG1GMkZMYkJiWWhYVWR1cmM=)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eG_9e_QNuoozo-T-wRT1vw.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URReE56ZzBNemd6TlRFM09UUTVNU0o5Lk5oMmExaFA3U3JLeVVpZWdRbl9ET0NjSzRQMVczWExMV2RDVUR6eFVRcU0=)
현대 서울에는 유사 죽음이 넘쳐난다. 막장 드라마 속 인물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갑작스레 죽는가 하면, 영화 속 주인공은 전개에 필요 없어진 인물을 손쉽게 처리한다. 체력이 소진된 게임 캐릭터는 곧 ‘리셋’되어 부활하고, 좀비는 좀처럼 죽지 않는 판타지를 반복한다. 도시인들은 대중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죽음을 감상하고 시청하지만 정작 실제로 마주한 죽음 앞에서는 입을 다문다. 누구도 죽음을 삶의 영역 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중문화에 재현된 죽음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프랑스 파리가 실제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서울과 조금 다르다. 파리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의 공동묘지를 즐겨 찾는다. 이곳에서 데이트와 산책을 하고 탭댄스를 추며 일상을 보낸다. 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는 자 옆으로 가장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파리의 묘지에는 삶과 죽음이 조용히 공존한다. 이 책은 근대화를 거치는 동안 도시에서 멀어진 서울의 묘지, 도시가 끌어안은 파리의 묘지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고찰한다. 화려함과 생기로 가득 찬 서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파리의 묘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 바로 삶에 대한 성찰일지도 모른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저자/역자
코멘트
3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묘지는 공공 산책로이며 만남의 장소였다. 봉안당 옆에는 상점이 있었고 회랑에는 수상쩍은 여자들이 어슬렁거렸다. 축제도 여기에서 열렸다. 이렇게 묘지에서 전율을 느끼는 것이 예삿일이었다.”
역사가 요한 하위징아의 묘사처럼, 중세 프랑스 파리에서 묘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생기가 넘치는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자리했다. 묘지는 항상 상인과 호객 행위를 하는 매춘부로 떠들썩했고, 시민들은 그 주위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일상을 보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사이, 파리의 묘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중반 오스만 남작은 파리를 전통 사회에서 근대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묘지 개혁 계획을 수립했다. 파리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묘지를 옮기려는 의도였지만, 이는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시 당국은 죽은 자를 삶의 터전 가까이에 두고 그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 모습이 현재까지도 남아, 도심 속 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 사회의 서울 역시 죽은 자를 경외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상을 경외하며 숭배하는 태도는 제사, 성묘 등 더욱 관습화된 의례 문화로 발전해나갔다. 마을 인근에 공동묘지가 자리를 잡았고, 백성들은 수시로 챙겨야 하는 행사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이곳을 찾아들었다.
그러나 서울과 묘지의 거리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군사 시설, 광산 개발 시설 등을 이유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묘지는 점차 서울 밖으로 밀려났다. 해방 이후에도 학교와 주택, 공장을 짓는 데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유배를 떠나듯 멀리 도시 밖으로 옮겨졌다. 묘지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갔다.
그 결과 오늘날의 도시인들은 죽음을 피하고 꺼리며, 삶과 완전히 분리된 특별한 사건처럼 여긴다. 죽음이 추방당한 서울은 화려한 불빛과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망자의 곁에서 지난날을 돌아볼 공간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빛으로만 가득한 공간에선 오히려 빛의 존재를, 그 소중함을 알 수 없듯 우리도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삶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없다.
현재 우리는 1년에 두어 번, 큰일이 있을 때만 묘지를 찾는다. 몇 시간이 넘게 달려 묘지를 방문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파리의 공동묘지들은 ‘묘지투어’로 불릴 만큼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묘지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파리 사람들처럼 죽은 자 곁에서 조용히 삶을 성찰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더 많은 코멘트를 보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