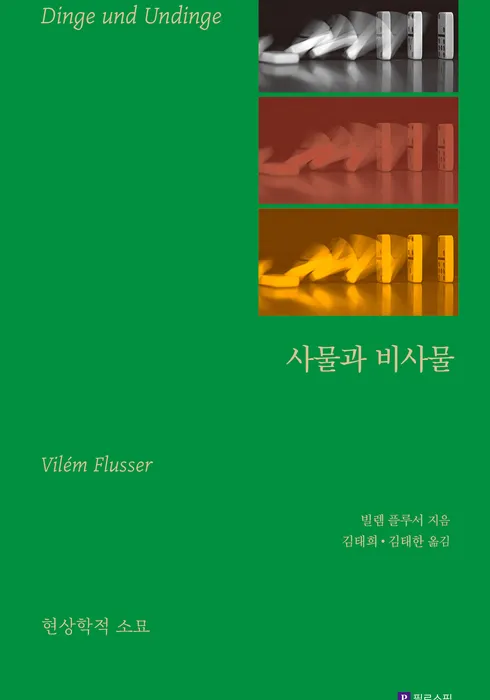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RxnUqIIUbhVRwcPaJ4NB2Q.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UTVPVEUzT1RrME5URXhOREl4TVNKOS40RzQyRFphdS03anZOWWY5U1FBVWZFWmpzaWdBQmdOSnZvRG9VSHc3Uk04)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i69HSjdDu0FbqFRTyouubA.jp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mNIUnpJanBiSW1KbklsMHNJbkFpT2lJdmRqSXZjM1J2Y21VdmNISnZiVzkwYVc5dUx6RXhOekExTURBNU9UVTRORGMwTXpNM0luMC5yN1dOc1RvM3BEY0I5ZTRuUXEtZWQ1N1FyalQ0RzRfSm1hTWhLbi1wRmg4)
《사물과 비사물: 현상학적 소묘》의 한편에는 병, 가로등, 체스, 침대, 지레, 양탄자, 항아리…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정보, 상징화, 코딩, 이미지, 프로그램…의 세계가 있다. 앞의 것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하며 고전적인 것들이고, 뒤의 것들은 어느 새 마찬가지로 지극히 일상적이 되었으되 우리의 존재와 맺는 관계가 앞의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이 책의 지은이인 매체철학자 빌렘 플루서의 구분에 따르면, 앞의 것들은 ‘사물’이고, 뒤의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물 아닌 것, 즉 ‘비사물’이다. ‘사물의 시대’에서 ‘비사물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끝자락에 살았던 철학자인 그는, 자신이 세계가 비사물화되고 ‘프로그램들’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리라는 낌새를 챌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앞으로의 사물들은 비사물들에 의해 점점 지워지고 밀려날 것이라고, 다소 쓸쓸한 어조로 말한다. 이 책에 실린 일련의 에세이들은, 플루서가 그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이었던 실존주의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곧 존재감이 희미해질 ‘사물들’로 하는 철학적 관조다. 지극히 단순하고 사소한 이 일상적 사물들은 소비사회와 대중문화를 통찰력 있게 비판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며, ‘자연’ 대 ‘문화’ 대 ‘폐물’이라는, 플루서만의 독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인간이 대하는 세계 삼분법을 제시하는 받침대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렇듯 플루서는 16개 에세이들의 소재가 되는 각각의 사물마다 특유의 각도로 빛을 비추며 인간 존재의 조건을 밝힌다. 독자들은 유희하듯 스케치하듯 펼쳐지는 사유를 접하며 일상적 대상들에 대한 관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플루서 특유의 시적이기까지 한 문체를 살린 역자들의 세심한 번역과 적재적소의 역주로, 플루서의 이 아름답고도 지적인 산문을 한층 깊이 있고 쾌적하게 읽을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코멘트를 보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