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_ “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1부 삶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철학을 본다
대학의 앎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가
탈시설, 그 ‘함께-삶’을 위하여
밤에 열린 어느 장애인 학교
2부 사건
책을 읽어주던 남자
_배움의 사건으로서의 책 읽기
민주주의, 그 새로운 무한정성
_월가 점거운동에 대한 하나의 보고
점거와 총파업
_장애인 운��동으로부터
탄원하는 노인들
3부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이름, 전태일
김주영, 그의 삶과 용기를 기억하라
우리의 투쟁은 생명의 저지선을 함게 만드는 일이다
_쌍용자동차 고동민
당신의 일, 그게 바로 내 일이다
_청년유니온 김영경
이 싸움엔 별수 없는 내 몫이 있다
_밀양 이계삼
다만 일주일을 하루씩 잘 살아내겠다
_W-ing 인문학 아카데미 최정은 이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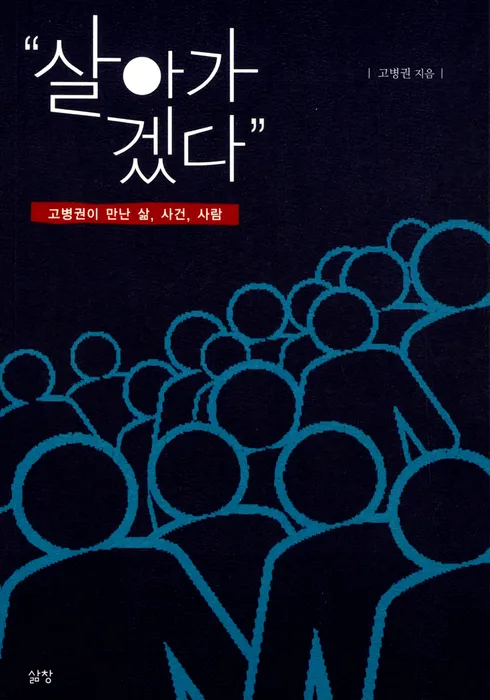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30n2nHWSAw51zVsHKabnBg.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lRBeU9USTRPRE14T1RJek9EUTNOU0o5LnJhWnI0MTlmU3o2TFBzZVVyemhLQksxRjdUZG1GMkZMYkJiWWhYVWR1cmM=)
![[광고]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보드배너](https://an2-img.amz.wtchn.net/image/v2/eG_9e_QNuoozo-T-wRT1vw.png?jwt=ZXlKaGJHY2lPaUpJVXpJMU5pSjkuZXlKd0lqb2lMM1l5TDNOMGIzSmxMM0J5YjIxdmRHbHZiaTh4TURReE56ZzBNemd6TlRFM09UUTVNU0o5Lk5oMmExaFA3U3JLeVVpZWdRbl9ET0NjSzRQMVczWExMV2RDVUR6eFVRcU0=)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현장 인문학’.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의 저자이고, 연구공동체 <수유너머R> 연구자인 고병권의 책이다. 저자 고병권은 지난 몇 년간 강연에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고받은 말을 디스크에 소리를 기록하듯 이 책에 담아냈다. 고병권이 만난 사람들은 섣부른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앞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꾸준히 살아간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나 희망이 덧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망한 이들이 아니라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들려주는 “꾸준��히 살아가겠다” “일주일을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영화 속 '주인'처럼 10대였던 시절 🏫
윤가은 감독이 사랑한 별 다섯 개 영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왓챠피디아 · AD
영화 속 '주인'처럼 10대였던 시절 🏫
윤가은 감독이 사랑한 별 다섯 개 영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왓챠피디아 · AD
저자/역자
코멘트
1목차
출판사 제공 책 소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점거, 새로운 거번먼트』의 저자이고, 연구공동체 <수유너머R> 연구자인 고병권의 책 『“살아가겠다”』가 출간되었다.
저자 고병권은 지난 몇 년간 강연에서, 사건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고받은 말을 디스크에 소리를 기록하듯 이 책에 담아냈다.
“여기에 적은 것은 글이 아니라 말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누군가를 초대해서 말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디스크에 소리를 기록하듯 몇 개의 트랙에 나누어 담았다.(…)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제로 말하고 들은 이야기들인데도 실상은 한 단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바로 ‘삶’이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제로 말하고 들은 이야기들인데도 이들이 만나는 지점은 ‘삶’이다. 철학도, 배움도, 투쟁도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자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도, 사람들이 저자에게 들려준 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절실한 질문이자 대답이었다. 이 책은 저자와 ‘길 위의’ 사람들이 함께 나눈 삶에 대한 공명(共鳴)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현장 인문학’
‘길’은 벽이 없이 사방이 뚫려 있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적인 장소이다. 또한 길은 과정이나 방법, 방향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하다.
중세의 대학은 길 위에 짚을 깔고 열렸으며, 2000년대의 투쟁의 장소는 공장 담을 넘어 길 위로 옮겨오고 있다. 장애인의 투쟁도 집 밖을 나서 길 위에 서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길은 주코티 공원이기도 하고, 대한문 광장 앞이고도 하며, 밀양의 움막이기도 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이기도 하다.
“현장이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흥미로운 단어이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사건에 대한 것이다. 즉, 현장이란 사건 현장이라는 용례에서 보듯, 무엇보다 사건의 시공간이다”
저자는 ‘철학자란 자기 삶으로 철학을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철학 개념을 읊어대고, 철학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을 철학자라 부르지 않는다면, 자기의 삶으로 철학을 입증하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이들이 ‘길 위의 철학자’가 아닐까.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라”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 후문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건설, 불법 대선개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힌 뒤 대자보 말미에 “만일 안녕하지 못한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하십니까!”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저자는 이 책 『“살아가겠다”』에서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할 용기다 .(…) 감히 알려 하고 감히 말하려 하는 용기가 없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한 학생의 ‘감히 알려 하고, 감히 말하려 하’는 용기로 시작된 이 대자보는 고려대 담장을 넘어 전국의 대학, 중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청년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다.
“우리는 위대한 누군가로부터 불을 나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계속 기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불은 금세 꺼져버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을 쉼 없이 가꾸어감으로써만 우리 영혼의 램프를 밝힐 수 있다. 그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은 참 멋진 학문이 아닌가.”
감히 알려 하고 감히 말하려 하는 삶,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삶. 이러한 인문학적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삶’으로 구성해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에서의 싸움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삶을 중단하는 싸움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싸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저자 고병권이 만난 사람들은 섣부른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앞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꾸준히 살아가며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나 희망이 덧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망한 이들이 아니라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들려주는 “꾸준히 살아가겠다” “일주일을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희망을 내일에 거느니 오늘에 걸고,
희망을 거기에 거느니 여기에 걸겠다.
희망은 지금 사막을 뚜벅뚜벅 걷는 내 다리에 있다.
이 글을 쓰던 날,
나는 대한문 농성촌의 한 의자에 누군가 적어놓은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
더 많은 코멘트를 보려면 로그인해 주세요!